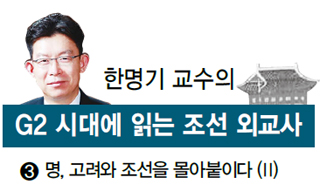 |
공순한 태도 보였던 공민왕
중원 정세 틈타 요양 점령도
명, 원 장수·고려 결탁 의심
명의 주원장이 고려와 조선을 불신했던 데는 나름의 배경이 있었다. 14세기 말엽 대륙에서 원명교체라는 격변이 벌어지고 있을 때, 고려와 조선을 이끌었던 정치적 주역들은 결코 만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공민왕, 최영, 이성계, 정도전 등은 중원 정세의 변화를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국익을 챙기고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부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과거 고구려의 고토였던 요동에 대해 야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주원장은 그 같은 야심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명은 몽골 잔여세력들을 제압하고 내정을 추스르는 데 집중해야 했으므로 요동 장악에 진력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주원장은 자연히 고려와 조선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파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동녕부 정벌과 북진정책의 재현
1368년 명 건국 직후, 공민왕은 사절을 보내 조공하는 등 공순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종일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공민왕은 급변하고 있던 중원의 정세를 엿보며 틈을 파고들었다. 명이 원의 잔당을 토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던 1369년(공민왕 18)과 1370년, 공민왕은 두 차례에 걸쳐 동녕부를 공격했다. 동녕부는 본래 1269년(원종 10) 고려의 반역자 최탄 등이 반란을 일으켜 서북 지역 60여 성을 원에 넘겨주면서 등장한 기구였다. 원은 이 새로운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평양에 동녕부를 설치했다가 1290년 관할 영역은 고려에 반환하고, 동녕부의 치소는 요동으로 이전한 바 있다. 공민왕은 동녕부 원정을 통해 요동 지역에 남아 있는 친원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원정 당시 이성계와 지용수 등은 1만50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북면, 함흥, 강계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입했다. 고려군은 당시 요양까지 점령했는데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모두 1만여호에 이르는 동녕부 지역의 여러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수천 마리의 우마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고려군의 요양 점령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요양은 이후 명이 요동을 지배하는 군정, 행정의 거점이었던 요동도사의 소재지였다. 또 요동도사는 후금의 누르하치가 요동을 장악하는 1620년대 중반까지 명이 조선과 여진을 감제하는 전진기지였다. 조선 개국 직후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요동을 공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끝내 무위에 그쳤던 사실을 고려하면 공민왕의 요양 점령은 고구려 고토에 대한 최후의 답파였던 셈이다. 나아가 고려가 건국 이래 추진했던 북진정책을 재현한 것이기도 했다.
 |
|
당당하고 위엄있는 황제의 모습으로 그린 다른 초상화와는 달리 주원장의 흉측한 얼굴을 묘사한 초상화. 그림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주원장은 실제로 대단히 시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고려와 조선을 의심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는 자신과 후손들의 황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신들을 마구 숙청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
하지만 명의 장악과 요동 지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유익의 투항에 불만을 품은 또 다른 원의 잔당들이 봉기한 것이다. 그들은 유익을 죽이고 명의 초무사를 붙잡아 당시 금산에 머물던 원의 장수 나하추 휘하로 귀순했다. 나하추는 원 초기 이래 유력한 공신이었던 무칼리의 후예로서 당시 요동 지역 최대의 세력가였다. 동으로는 여진 지역을 초무하고 남으로는 고려까지 위협했던 나하추를 제압하지 않는 한 명의 요동 장악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나하추는 명의 요동 진입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1372년 그는 명군의 보급 기지였던 우가장을 공략했다. 나하추의 기습을 받아 명은 5000명의 병력이 죽고 10만석의 양곡을 잃는 피해를 보았다. 명은 나하추의 공격을 받은 직후 고려를 의심했다. 고려가 나하추와 결탁하여 우가장 기습에 협조했다고 본 것이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고 난 뒤 고려와 명의 갈등은 본격화되었다. 명은 자신들에게 대체로 공순한 자세를 취했던 공민왕의 죽음 배경을 석연치 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더욱이 공민왕 사후 우왕을 옹립한 이인임 일파는 공민왕과 달리 친명적인 태도를 파기하고 명과 북원 사이에서 양단을 걸치기 시작했다. 북원의 사신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공민왕이 파기했던 북원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명의 불만은 당연히 높아졌다. 주원장은 우왕에 대한 책봉을 거부했다. 1377년 고려가 공민왕의 시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공민왕 시해를 은폐하기 위한 술수”라고 뿌리쳤다. 1379년에는 ‘고려가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오랑캐’, ‘금수’라고 노골적으로 매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요동의 관원들에게 고려의 침략에 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1374년부터 1390년께까지 주원장이 고려에 보낸 국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글자는 고려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사(詐)’자였다.
 |
|
요양의 상징인 백탑의 모습. 요동도사가 위치했던 요양은 여말선초 명의 요동을 향한 전진 기지이자 조선 중기까지는 조선과 여진을 견제하고 회유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거점이었다.
|
요동 장악 첫발뒤 본격 압박
최영, 원정 준비 돌입해 맞서 그와 함께 주원장의 고려에 대한 태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1384년 9월, 고려의 사신이 공민왕의 시호를 요청했을 때만 해도 주원장은 그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고려가 공마 5000필을 보내오자 주원장의 태도는 누그러진다. ‘내가 공민왕 사후 고려를 닦달한 것은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짐짓 태도를 바꾼다. 이어 7월에는 공민왕의 시호를 내려주고 사신을 보내 우왕을 책봉하기로 결정한다. 명의 태도 변화는 고려를 회유하여 나하추와의 연결을 막기 위한 책략이었다. 이윽고 1386년(우왕 12) 12월, 주원장은 장군 풍승에게 요동 공격에 나서라는 유시문을 내린다. 명군은 오늘날의 승덕 부근에 병참기지를 설치한 뒤, 1387년 6월 나하추를 공격하여 금산 지역을 장악했다. 1372년 나하추로부터 습격을 받은 이후 15년 동안 요동 장악의 기회를 노려왔던 명은 마침내 그 첫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나하추라는 걸림돌이 사라지자 명의 군사력은 요동 전역과 고려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1388년 주원장은 고려에 보낸 국서에서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철령 이북 지역의 땅과 거주민은 과거 원의 개원로에 속했으므로 앞으로는 요동에서 관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고려 조정은 바짝 긴장한다. 우왕은 곧 홍무 연호의 사용을 중지했고, 실권자 최영은 명의 압박을 빌미로 요동에 대한 원정을 준비한다. 바야흐로 고려왕조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외교적 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명지대 사학과 교수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