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9.09 18:45
수정 : 2011.10.26 12:02
이영준의 대양횡단 기계탐험기 13 항해와 미신
대항해 시대에 믿을건 기도의 힘
악령 쫓으려 여성의 상 새겨붙여
‘방랑하는 네덜란드인’ 전설도…
‘여성 승선’ 금기는 오래전 깨져
수에즈운하를 빠져나온 페가서스는 다시 망망한 지중해로 들어섰다. 지중해의 딱 중간에는 작은 섬나라 몰타(Malta)가 있는데, 그 수도 발레타(Valletta)는 페가서스의 고향이다. 페가서스가 태어난 곳은 한국의 울산이지만, 현재의 선적이 있는 주소지는 발레타이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인 것이다.
그러나 오대양을 떠도는 페가서스가 고향에 들를 시간은 없다. 아름다운 휴양지 몰타에 기항하려나 기대를 해봤지만 페가서스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올 때만 몰타에 들르고 유럽으로 가는 길에는 스쳐지나갈 뿐이다. 다시 육지가 그리워진 나는 몰타의 땅이 어떻게 생겼나 쌍안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페가서스의 항로는 몰타를 먼발치에서만 지나칠 뿐이다.
 |
|
망망한 저녁바다를 항해하는 컨테이너선. 옛적 뱃사람들은 미지의 위험을 향해 항해했다.
|
해도상으로는 몰타의 아래쪽을 바싹 지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의 거리는 20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 땅을 좀 보고 싶은 나의 간절한 욕구는 지브롤터에 닿을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 바다라는 것이 참 넓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낀다.
페가서스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처럼 크고, 절대로 항로를 틀리지 않을 것처럼 정확하고 믿을 만하다. 옛날 15~17세기 대항해시대에는 어땠을까? 큰 배라고 해봐야 길이가 50미터도 되지 않았다. 먹을 것이라고는 냄새 나는 썩은 물과 하도 딱딱해서 바닥에 던져도 안 깨진다는 말린 빵, 역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소시지밖에 없었다. 그 시대 항해에서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었다. 지금 사람들도 합리적인 수단이 동났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는 매한가지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근대적 문명의 힘을 빌려 잠시 그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문명의 힘이 다하면 현대인도 옛날 사람과 같은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양의 물은 서로 통해 있으므로 바다의 길은 결코 끝이 없으며, 바닷사람의 항해도 끝이 없다. 바다는 한없이 거칠고 인간은 한없이 약하다. 바다는 미신이라는 바이러스가 생장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 바다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바다는 넓지만 거기서의 삶은 폐쇄돼 있다. 바다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자신의 존재를 붙들어 매어줄 강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그때 생겨난 것이 미신이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망망하고 캄캄한 바다에서 폭풍우는 사정없이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에 배는 사정없이 농락당하듯 요동친다. 나 자신은 나를 구원해 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럴 때 초자연적인 힘에 빌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옛날 배의 머리에 주로 여성의 상을 새겨 붙인 ‘선수상’(船首像: figurehead)이다. 뱃머리에 선수상을 달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였다. 당시 뱃사람들은 선수상이 악령을 쫓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거친 바다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항해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과 싸우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힘을 줄 부적 비슷한 것이라도 필요했을 것이다. 선수상은 바다에 산다고 믿었던 정령을 나타내는 형상이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뱃머리에 바다의 정령이 살고 있어서 뱃멀미와 폭풍우로부터 뱃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었다. 네덜란드의 뱃사람들은 선수상을 달지 않은 배가 가라앉으면 선원의 혼령이 영원히 바다를 떠돌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런 미신이 돌고 돌아서 ‘방랑하는 네덜란드인’(Flying Dutchman)의 전설이 된 것으로 보인다.
 |
|
방랑하는 네덜란드인 우표(위), 영국 브리스틀과 미국 뉴욕을 오가던 에스에스 그레이트브리튼(SS Great Britain)호의 뱃머리에 달린 선수상(아래).
|
방랑하는 네덜란드인이란 폭풍우의 곶을 돌아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한 선장이 악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전설이다. 그 대가로 그는 최후의 심판 날까지 바다 곳곳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았다. 그는 7년에 한 번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데, 그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인을 만나야 구원을 얻고 죽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전설에는 몇 가지 해상사고가 섞이면서 점차 이야기가 발전해 갔다. 모든 전설과 미신이 그렇듯이, 방랑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다. 뱃사람들이 바다를 떠돌며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옮겨지듯이, 이 전설 이야기는 엉뚱한 어원으로부터 생겨났다. 1690년 페르훌더 플라밍(Vergulde Vlamingh)호가 남아프리카의 테이블 만에서 증발하듯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배의 이름이 유사한 발음의 ‘플리헨더 플라밍’(Vliegende Vlamingh; 떠다니는 플라밍호)이 되었다가 영어식 발음인 ‘플라잉 플레밍’(Flying Flemingh; 떠다니는 네덜란드인)이 되었고 곧 ‘플라잉 더치맨’ (Flying Dutchman)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방랑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말은 전설이 바다 위를 떠돌면서 발음도 점차 변하고 거기에 이야기들이 덧씌워져서 생겨난 것이다. 19세기에 많은 작가들이 이 전설을 각색하여 시와 소설을 썼고 최종적으로 19세기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이 제목으로 오페라를 써서 더 유명해졌다.
항해와 연관된 가장 뿌리 깊은 미신은 여자가 배에 타면 재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더이상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배에 여성이 타는 것에 대한 금기는 깨진 지 오래다. 선원이 가족을 태우고 항해를 할 수도 있으며, 선원 중에 여성도 간혹 눈에 띈다. 전에 부산항에서 본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선장과 1등 항해사는 여성이었다. 북유럽 여성으로 보이는 그들은 체격도, 성격도 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한국의 해군사관학교에도 여생도가 많아지고 있다. 페가서스의 갑판원 에두아르도는 전에 현대상선의 배를 탄 적이 있는데, 소주 네 병을 마시는 20대 한국 여성이 선원으로 있었다고 한다. 미신은 시대가 변하면서 불합리해서 깨지기도 하지만 당차고 적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깨져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랑하는 네덜란드인의 전설은 단순한 미신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지구상에 드넓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떠돌며 생활하는 바닷사람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삶에 대한 은유인 것 같다. 왜냐하면 바닷사람은 육지의 집에 쉽게 돌아갈 수 없으며, 집에 갔다가도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산업 덕분에 어떤 물건을 멀리까지 보낸다는 것이 엄청나게 쉬워졌다. 육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물건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까지의 힘든 노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일은 육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라디오가 발명됐을 때 사람들은 이제 무전으로 송수신을 하니 사람이 직접 돌아다닐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정보의 소통이 많아지고 빨라졌고, 세상은 더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더 바빠졌고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다. 그래서 교통량은 더 늘어났다. 결국 라디오의 발명은 세계가 팽창하는 징후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소통하여 사람이 오고 갈 일이 적어진 것 같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세계는 더 복잡해졌고 돌아다닐 일이 많아졌다.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는 오대양을 건너 물건을 움직이기 위해 힘들게 돌아다니는 바닷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는 점이다. 방랑하는 네덜란드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인을 만나야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페가서스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며, 나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아슬아슬하게 가르고 있는 지브롤터 해협의 모습에 대해 기대를 해본다. 기계비평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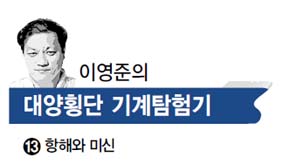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