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0.17 17:09
수정 : 2011.11.09 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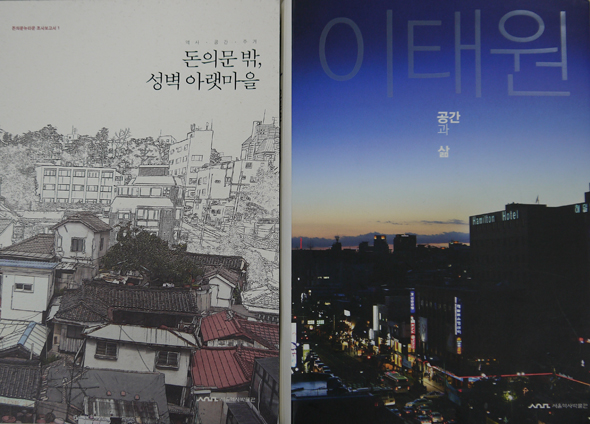 |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의 공간 탐사 보고서. 왼쪽은 돈의문 뉴타운 조사보고서 1 ‘돈의문 밖, 성벽 아랫마을’. 오른쪽은 2010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이태원 공간과 삶’.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
<2회> 명동에 사는 사람들
보조 2: 공간탐사에 나서는 사람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은 2007년부터 왕십리, 아현동, 세운상가, 이태원 등 10여개 지역을 조사한 공간 탐사 보고서를 내놨다. 2005년부터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하자 재개발로 사라지는 도시 공간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보자는 취지였다.
김상수 학예연구사는 “재개발 특성상 그전 동네는 완전히 해체가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토박이들도 모두 떠나 공간도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것이 안타까워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공간 탐사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재개발 지역뿐 아니라 창신동과 동대문, 강남, 명동 등 서울 도심 전체로 공간 탐사 지역을 넓혔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서울 도심 성격상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모든 공간이 ‘재개발의 현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김 연구사는 공간 탐사의 의미에 대해 “공간 탐사는 역사에 대한 기록일 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공간과 삶을 성찰하는 기회”라며 “개인들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과 개인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작업으로 일종의 ‘풀뿌리 역사 찾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시 공간의 기록이라는 것은 관공서가 발간한 도시계획 문서나 홍보 자료 속에서만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일궈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공간 탐사에서는 개인의 구술을 통해 시대를 조명하고, 공간을 엿보고자 시도한다. 김 연구사는 주민들 반응과 관련해 “처음 개인사를 구술할 때는 시큰둥한 반응이다가 나중에 공간 탐사 결과를 책으로 묶어 가지고 가면,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의 개인사도 이야기가 되느냐’고 기뻐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공간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홍승주 학예연구사는 “공간과 개인사를 구술할 어른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인터뷰 대상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생활 노출을 꺼려 진솔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인터뷰 대상이 공간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할 여지는 없는지 등 세심하게 살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간 탐사가 지속되고, 공간에 대한 정이 깊어질수록 탐사자들은 늘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한다. 홍 연구사는 “공간 탐사를 할 때마다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 그전에 생존하던 공간을 송두리째 지우는 것이 꼭 좋은 개발이냐’고 사라져가는 골목과 동네가 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올해에도 서울 2곳(동대문•창신동 일대와 명동의 공간)에서 공간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2곳 모두 재개발로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급변하는 공간, 역사적으로 중요한 서울의 공간이다. 오는 12월이면 2곳의 공간과 생생한 삶의 기록을 보고서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꾸준한 공간 탐사 노력에 풀뿌리 문화단체들도 호응하고 있다. 성동문화원은 최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공간조사 모임을 꾸려 성수동 인근 재개발 지역 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금까지 축적한 공간 탐사 성과물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할 계획이어서 일반인에게도 공간 탐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기획: 신기섭·박종찬 | 글, 사진 취재·편집: 박종찬 pjc@hani.co.kr | 지도·슬라이드: 신기섭 | 개발지원: 원수연 |
|
|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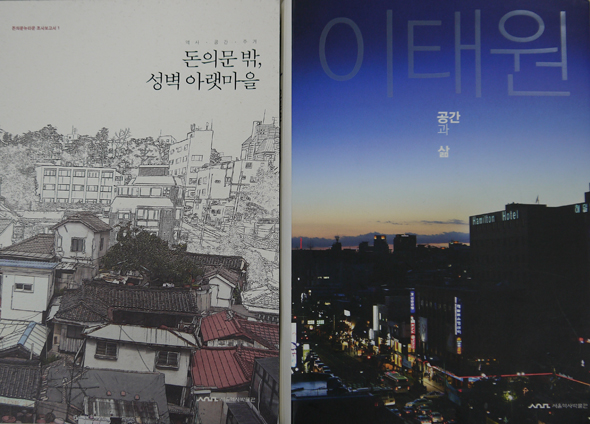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