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함민복 시인이 강화도 초지대교 옆에 위치한 인삼가게 ‘길상이네’에서 인삼에 물을 뿌리는 모습을 부인 박영숙씨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 강화/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최재봉 기자의 그 작가, 그 공간 ③ 함민복과 ‘길상이네’
김포에서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로 들어서면 바로 왼편으로 초지인삼센터 건물이 나타난다. 48개 인삼 가게가 모여 있는 이 공동상가의 제5호 ‘길상이네’가 함민복 시인 부부의 생활 터전이다. 함께 입주해 있는 다른 가게들과 마찬가지로 수삼, 건삼, 홍삼 등 세 종류 인삼에다 홍삼원액과 절편, 젤리, 사탕, 건빵 같은 홍삼 제품, 그리고 대추, 마, 쑥, 도라지, 꿀 등 다양한 농산품을 취급한다. 옥호는 부부가 기르고 있는 개 이름에서 따왔다. 혼자 살던 5년 전 시인이 강화읍 장에서 사 온 강아지 길상이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 ‘누이동생’ 길자와 함께 부부의 집을 지킨다. 올해 3월 동료 문인들의 축복 속에 늦결혼을 한 쉰 살 동갑내기 부부는 서로를 ‘길상 아빠’ ‘길자 엄마’라 부른다.
쉰살 동갑내기 부인과 ‘늦결혼’강화에서 홍삼 등 농산품 팔며
유인서 생활인으로 한발 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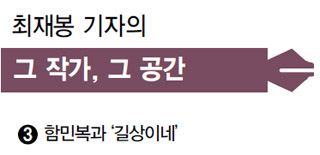 |
그가 살던 양철지붕 집 아래 동막해수욕장 솔숲에는 얼마 전 그의 강화 뿌리내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 하나가 들어섰다. 그의 시 <딱딱하게 발기만 하는 문명에게>를 새겨 넣은 둥근 화강암 탁자에 돌 벤치와 석상 등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이다. 시인 자신은 쑥스럽다 못해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반대했다지만, 이 조형물은 시인에 대한 강화 사람들의 애정의 증표로서 아름답다. “거대한 반죽 뻘은 큰 말씀이다/ 쉽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물컹물컹한 말씀이다/ 수천 수만 년 밤낮으로/ 조금 무쉬 한물 두물 사리/ 소금물 다시 잡으며/ 반죽을 개고 또 개는/ 무엇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만들지 않는 법을 펼쳐 보여주는/ 물컹물컹 깊은 말씀이다”(<딱딱하게 발기만 하는 문명에게> 전문)
 |
|
함민복 시인이 강화군 길상면 자신의 집 서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강화/신소영 기자
|
가게에 오는 손님·트럭 행상…
나의 생활이 모두 시의 소재 <눈물은 왜 짠가>로 유명한 시인의 어머니는 2009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었던 시인은 아내를 얻고 가장이 되었다. 좋아하던 술을 자제하고, 문학과 함께 생활을 챙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무위와 자유를 버린 대신 책임감과 행복을 얻었다. 오래 혼자였던 그에게 결혼이란 “밥을 같이 먹을 사람, 드러누워 대화할 상대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가 최근에 쓴 시 <당신은 누구십니까>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인 자(字) 수백 뿌리 눕혀 놓고/ 삼 보고 가시라고 하루 종일 같은 말 반복하는/ 주민등록등본 내 이름 밑에/ 당신 이름 있다고 신기해 들여다보던/ 밤이면 돌아와 인삼처럼 가지런히/ 내 옆에 눕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의 누구여야 합니까” 시인의 부인 박영숙씨는 본래 함민복 시의 열렬한 팬이었다. 영등포에 살던 그이가 멀리 김포까지 시 창작 강의를 들으러 다닌 것도 그 때문이었다. 10남매의 막내인 박씨는 인삼밭 이엉을 엮어서 번 돈으로 중학교에 진학했다고 했다. 인삼과의 인연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셈이다. 그 부인이 시인 남편을 평한다. “함 시인의 매력은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쩐지 깊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그런가 하면 귀여운 구석도 있어요. 특히 술 마시고 길자를 부를 때요. 함께 살아 보니까 애기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는 이의 질투를 유발하는 부부의 ‘닭살 애정행각’을 지켜보고 있자니 시인이 아직 혼전에 쓴 시 <부부>가 머리에 떠오른다. 늙다리 총각 주제에 후배의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었을 때 들려준 말을 시로 다듬은 것이라고 했다.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부부> 전문) 지금 시인은 부인과 함께 긴 상을 들고 생의 후반부를 걷고 있다. “한 발/ 또 한 발” 보폭과 속도를 맞추어 가며. 부부는 서로를 읽으며 삶이라는 시를 쓰고 있다. “전처럼 바다와 뻘 얘기를 집중적으로 쓰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의 제 삶을 글로 쓰면 되지 않겠어요? 가게 앞의 만국기와 주차장의 휠체어 마크 같은 걸 시로 쓰기도 했습니다. 과일과 양말, 옷 같은 물건을 팔러 오는 트럭 행상 이야기, 인삼으로 술 담그는 이야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 이야기 등 여러가지를 쓸 수 있겠지요.” 그렇다. 지금 초지인삼센터 제5호 길상이네에서는 함민복 문학의 새로운 씨앗이 움트고 있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