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14 17:05
수정 : 2012.11.14 17:05
[매거진 esc] 나의 점집문화답사기
사주점편 외전 - 성명점편 ①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중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가 있다. 고국 미국에선 덜렁 6장, 바다 건너 남아공에선 몇백만장이 넘는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우고 사라진 유령가수를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추적한다는 내용의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인데, 영화 초입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즈’라는 가수의 음반 제작자가 이런 말을 한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그 시대가 원했던 바로 그런 음악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파묻혀 버렸는지.”
제작자의 말 그대로다. 음악은 훌륭하다. 그를 둘러싸고 퍼진 각종 화려무쌍한 자살설들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그리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면 나 같아도 그러겠다. 하지만 로드리게즈의 실패 원인은 너무나도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이름이었다. 그의 음반이 나왔던 시절은 한창 미국이 히피 무브먼트, 포크뮤직, 블루스록, 피스&러브 등등으로 들떠 있던 시대였다. 남미스런 향취 물씬 풍기는 그의 이름(음악이 아니다)은 처음부터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의 이름은 그와 사람들 사이를 막은 가장 높은 장벽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최소 이러한 경우 이름은 결정적이다. 음악에서만이 아니다. 영화나 책 같은 경우에도 이름(제목)은 핵심적 흥행요소다. 당장 떠오르는 예로서 <아멜리 풀랭의 놀라운 운명>이란 영화는, 제목이 네 글자여야 흥행한다는 당시의 지배적 작명철학에 힘입어 <아멜리> 아닌 <아멜리에>란 제목을 달고 개봉된 것 등등, 이러한 사례들은 유사 이래 점집에 흩뿌려진 쌀알만큼 많다. 따라서 성명이 장르를 초월한 범점술적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점술 장르가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적 필요성만이 성명(姓名)점을 지탱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은 싫건 좋건 한 사람의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이고,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기질/개성/운명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다, 라는 나름 말 돼 보이는 이론 또한 성명점의 발바닥을 받쳐주는 양날의 작두날이 되어왔다. 게다가 성명점은 영유아들의 작명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복채수입을 상회하는 안정적 수익모델까지 확보되는 은근 짭짤한 장르이기까지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개 답사자인 필자가 용하다는 작명집 가서 비싼 돈 내고 작명을 한 아동들의 일생이 어떻게 풀렸는지를, 쌀알에 팔만대장경 새기는 마음으로 일일이 전수추적조사를 할 수도 없는 일. 해서 필자는 언제나처럼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름 높은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성명점집에 대한 답사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 점집 이름 하여 ‘○○할머니집’이다.
당해 점집은 그 구수한 하우스명 그대로 그야말로 ○○구에 위치한 주거공간(즉 가정집)인 평범한 한강 주변 아파트단지의 20×동 10×호에 위치하고 있었던바, 아아, 이 어찌 아니 작명철학적 원리에 본의 아니게 충실한 점집이라 할쏜가. (다음 회에 계속)
한동원 소설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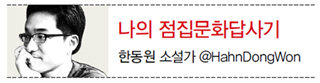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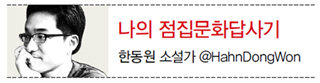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