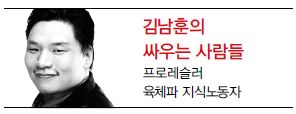 |
[매거진 esc]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불법성매매에서 ‘성노동’으로 합법적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여성 김씨
‘싸우는 사람들’을 연재하면서 몇가지 세운 원칙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터뷰 당사자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인터뷰 질문지를 주욱 인쇄해서 문답하고 돌아가는 수동적인 인터뷰 또는 자기 혼자만의 정의어린 주장에 갇혀서 결기를 뿜다가 가는 기자들을 자주 봐온 터라 그런 것을 피하고 싶었다. 교수라면 강의를 들어보고 운동선수라면 같이 운동을 해봤다. 그렇게 몸으로 대화를 하면 더 통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화(가명·25)씨를 만날 때는 사전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사진촬영 때문에 사진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 건너편으로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 “성노동자입니다”라고 말해줬는데 잡음도 있고 단어 자체가 생경해서인지 못 알아듣는다. 수차례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고 말았다. “성노동자, 그러니까 (지지직) 창녀라구요.”
“이런저런 알바를 했지만월세에 학비까지 낼 수 없었어요
미아리까지 가게 됐지요” 오랜만의 비소식으로 마음은 촉촉하지만 몸은 축축했던 수요일 낮 명동성당 건너편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2008년부터예요. 대학에 입학하고 학비를 벌려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는데 도저히 월세와 학비를 같이 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벌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미아리까지 갔지요.” 첫 만남이라 넌지시 물었는데 바로 결론(?)까지 도달했다. 그곳에서 일은 생소했지만 노동환경 자체는 맘에 들었다고 했다. 특히나 임금체불도 없었고 동료들과 업주들도 모두 친절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깡패한테 맞았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깡패 편을 들었다는 뉴스가 갑자기 떠올랐다. 하지만 창녀라는 낙인에 대해선 본인도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어쨌든 정말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술에 의지해 시간을 보냈다. 취하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잊을 수 있으니까.
 |
|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
| |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레드 마리아>란 영화가 있어요. 여성의 몸과 노동에 대한 다큐인데 그중에서 성노동도 다루고 있지요. 영화 관련 간담회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여성단체 관계자분들 몇몇은 시종일관 제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쪽’이라고만 하더군요. 어떤 분은 아예 저한테 ‘너’라고 하며 반말로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영화제를 기획한 곳에 항의해서 결국 그쪽에서 사과문까지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가 하는 지금의 이 활동에 대해서 아군을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못 본 척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궁극적으로는 성노동의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목표예요. 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교과서에 쓰여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중학교 강연을 가서 장래희망을 적으랬더니 ‘정규직’을 적는 학생도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공권력과의 관계. 인류의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 다음으로 오래된 직업 성노동. 현대의 제사장은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고 현대의 성노동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잃었다. 여기에 우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아니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해본 적은 있는가. 인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소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통계청의 직업조사 목록에 과연 성노동 항목을 넣을 수 있을까. 건너편 테이블의 손님들이 큰 목소리로 연예가 잡담을 나누다가 절도로 걸린 어느 전직 탤런트의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몸이라도 팔지”라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이야기를 들으려다 나한테 던지는 질문만 가득 얻은 인터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김남훈 프로레슬러·육체파 지식노동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