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주민씨
|
[매거진 esc]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야간시위 금지 위헌판결’ 이끌어낸 박주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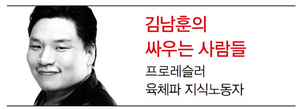 |
서울대 법대
철거민들과 연대투쟁하다
사법시험 결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지독하게 해서 많이 위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고 결심을 했죠.” “그랬더니요?” “학생운동판에 있더라구요. 하하.” 그는 학생운동에 열중하면서 공부와는 거리를 두었고 사법시험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대학 4학년 때 신도림 철거민들이 연대를 요청해왔어요. 구청장과 이야기나 해보자고 해서 구청을 갔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한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는데 구청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초등학생도 둘이나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오후 5시까지 눈을 펑펑 맞으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어요.” 질서정연했던 음성신호의 템포가 불규칙해졌다. “덜컹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사법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힘에 대한 갈증은 수컷의 본능이다. 그러나 그 힘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다. 환경에 맞추어가며 자신의 의지를 올곧게 펴는 인물은 드물다. 몸 전체의 근육량은 내 허벅지 하나만큼도 안 나올 것 같은 이 남자에게서 갑자기 위압감이 느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를 갔다가 1년 반 정도 시험 준비하고 고시에 합격을 했지요.”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참으로 담담하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성룡에게 물어봤단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냐고. 그랬더니 성룡은 “그냥 뛰어내리면 돼요”라고 대답했단다. 남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또는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사법시험에 대한 부분은 저렇게 딱 한 줄로 지나갔다. 그는 공익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의 주고객은 돈과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의 은행잔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 이런 길을 갔을까. “제 욕심대로 살고 싶었어요.” “욕심이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제 욕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욕심이요.” “아항. 그런 욕심.” 겉으로 감탄사를 뱉으면서도 갑자기 내가 너무 창피해졌다. “연수원 나올 때쯤 이곳저곳에서 제의가 많이 왔어요.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공익성이 강한 로펌을 선택했구요. 거기서 일하면서 빚도 다 갚았어요.” “빚이요?” “전 시험 준비하면서 모두 제 돈으로 했거든요. 대출도 받고 그랬죠.” 그는 야간집회 위헌판결을 비롯해서 굵직한 사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의 반대편엔 권력이 또는 재벌이 있다. 그는 항상 힘겹게 싸워야 한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아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에 대한 의뢰는 많이 오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개중에는 의뢰하신 분들이 감정이 격앙돼서 저희한테 분풀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멱살 잡히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저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대로 안 나오니까.” 그는 본격적으로 공익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로펌을 퇴사하고 새로 법률사무소를 연다. 그 이름도 써 이(以), 공공의 공(公)을 써서 ‘이공’이다. “로펌 나와서 법률사무소를
만든다니까 걱정 많으셨어요
모나게 살다가 다칠까봐요” 이 땅에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그래도 효도는 두번 하셨네요.” “효도요? 아 두번. 네 맞아요.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종종 듣는 클리셰 ‘엄마, 변호사님댁에서 결혼을 승낙하셨어요’라는 대사. 그렇다. 변호사는 그야말로 높은 사회적 신분과 안정적인 경제소득의 상징. 그러나 그 반대로 뛰어가는 그를 보며 부모님은 어땠을까. “로펌을 나와서 법률사무소를 아예 만든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모나게 살다가 제가 다칠까봐요.” 부모님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갑자기 나도 슬퍼졌다.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같이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시더라구요. 어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휴.” 왜 이 코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가. 한편 프로레슬러인 나에게는 그가 너무나 신기했고 “그런데 그거 진짜 안 아파요?”라면서 그는 나를 신기해했다. 이 글 초입에 있었던 일을 다시 살펴보자. 그는 작년 초 한 방송사 다큐제작팀의 제안으로 나와 함께 한 보수단체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말해주면서 소통을 시도했던 것이다. 비록 단 5분 만에 욕설과 고성방가로 무위에 그치긴 했지만 말이다. 그는 수백명 앞에서도 결코 꿀림 없이 당당했다. 그 당당함은 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기반한 것이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전화가 왔다. 새로 얻는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는 몇개가 필요한지. 자질구레한 일을 직접 하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자의 묘한 흥분과 두려움이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다. 김남훈 프로레슬러·육체파 지식노동자 사진 박미향 기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