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4.04 17:08
수정 : 2012.04.04 17:08
[매거진 esc] 임경선의 남자들
사람들이 영화 <건축학개론>을 두고 애틋한 첫사랑의 영화라며 치켜세우는 데 왜 나는 삐딱할까 생각해보니, 한 장면이 계속 아른거려서였다. 건축설계사인 남자주인공 승민이 첫사랑, 서연의 남편 직업을 묻는 대목이었다.
“남편은 뭐 하는데?” “어, 의사.” 대수롭지 않게 무심한 톤으로 대답하는 서연을 보면 마치 출신 학교를 묻는데 “어, 서울대”라고 휙 대답하고 넘어가려는 느낌. 마치 그래야 개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대답들은 어떻게 대답해도 다 살짝 재수없게 들리거든?
‘의사’라는 남자의 직업은 이를테면 여자에게 있어 ‘시집 잘 갔다’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클리셰’ 직업이다. 대학병원 근무의든, 개업의든, 군의관이든 ‘우리 남편 의사야’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많은 것을 묻질 않는다. 하지만 같이 의대를 다니지 않는 한, 미래의 의사와 자연스럽게 만나 연애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외부인 여자에겐 그것은 구체적인 목표의식과 적극적인 소개를 필요로 했는데 그나마 아무 생각 없던 여자들도 슬슬 결혼을 의식할 무렵부터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내가 이십대 중반 시절에는 의사 남편을 잡고 싶으면 매년 특정 날에 전국의 예비의사들이 시험 치러 모인다는 남산의 한 호텔 로비에서 죽때리라는 농담 같은 전설이 돌았다. 우리는 낄낄대며 그 이야기를 퍼트렸지만 분명 그것을 진지하게 귀담아듣던 애들도 있었으리라. 실제로 얼마 안 지나 ‘곧 죽어도 의사랑 결혼하고 말겠다는 여자들’이 진짜로 존재함을 알았으니까.
그녀들이 무엇보다 대단했던 것은 키가 작든 못생겼든 집이 못살든 무조건 의사면 된다는 확고함 때문이었다. 나 좀 잘났다 하는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포기 못해 ‘이 남자를 어떻게 뜯어고쳐’라며 전전긍긍 마음이 붕 뜰 무렵, 그녀들은 묵묵히 ‘꽃보다 열매’라며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다. 그렇게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들을 쫓고 기다려 내는 현실감각을 두고 나는 그저 ‘돈 가진 미인은 남자의 재능을 사고 돈 없는 미인은 남자의 돈을 사는구나’ 정도로 관조했으니 불행히도 그런 타입의 여자들과는 좀처럼 친해지기가 어려웠다. 그것을 진부함으로 조롱한 나 역시도 꽤나 진부했던 셈이다.
내가 의사를 진지하게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행히도 결혼 후였다. 몸이 자주 아프다 보니 자연스레 많이 접하게 되면서부터다. 혹자는 그들의 흰 가운이 좋다고도 하지만 나로서는 내 건강을 맡긴다는 것이 그 순간만이라도,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게다가 그들을 거치면 뭔가 몸이 좀 개운해져서 돌아오지 않던가. 그들은 참 ‘잘 만질 줄 아는 남자’였다. 너무 끈적하게 만지면 불쾌하고, 자신 없이 쭈뼛쭈뼛 만지는 것은 못 미덥고 짜증나는데 그들은 성적 함의 없이도 내 몸의 한 부위를 자신 있게, 그리고 자상하게 만져서 좋았다. 만짐을 당하면서 어쩜 이토록 안심이 되지? 집에서도 이렇게 자상할까? 나도 의사랑 결혼했다면 돈 걱정 없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하지만 딱 한 번 엄마가 애써 긁어 온 의사랑 선봤을 때 골프셔츠 입고 나타났다고 튕긴 걸 보면 엄마 말대로 난 애초에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임경선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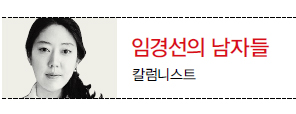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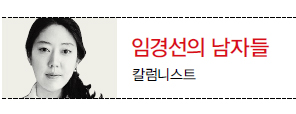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