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5.02 16:53
수정 : 2012.05.02 16:53
[매거진 esc] 임경선의 남자들
굳이 나눈다면 나는 남자를 무척 좋아하는 부류에 속하는 여자이지만 그만큼 남자를 미워하는 강도도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미혼시절 연애할 때엔 남자가 고통을 줘도 미워했다기보다는 원망했다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 시절 그들의 죄는 오직 한 가지, 나를 덜 좋아한 것이지만 그것이 엄밀히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일 뿐이었다.
기이한 고통,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남녀가 사랑의 결실을 맺어 한 가족이 되면서부터다. 공적 영역의 남녀 갈등은 법의 문제, 사적 영역의 남녀 갈등은 애정의 문제로 정리한다고 쳐도 시스템과 개인의 문제가 미묘하게 얽힌 가정생활 속의 양성평등의 문제는 닫힌 문 안쪽으로, 심판이 없는 상태로,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하면서 일렁이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가사나 육아, 감정노동 분담문제의 놀라운 점은 해가 거듭될수록 순화보다는 심화가 된다는 점이다. ‘아내’라는 이름에 ‘엄마’라는 이름이 보태지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과 노동과 죄의식은 갑절로 더해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뒤늦게 효자 되어 오로지 이해하고 품는 모정만을 격하게 찬양하며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그들에겐 아무런 악의가 없다. 분담 격차의 누적분은 날로 쌓여가는 와중, 집안일에 대한 감각이 점차 마비되다 보니 자신의 밉지 않은 가부장 코스프레가 여자를 얼마나 고역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덩달아 마비되는 것이다.
한국 남자들한테 뭘 바라, ‘아들 하나 더 키우는’ 심정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체념한다 쳐도 정작 뒤통수치듯 큰 절망을 안겨준 것은 정말 근사하고 괜찮은 남자들조차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바랄 때였다. 그 남자들은 여성문제를 제외한 그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를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세련되고 관대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멋졌기에 그 앞에서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탁하고 어색했다. 뿐만 아니라 ‘피곤하게 각 세우지 말고 여자로서의 행복을 충분히 누려, 넌 그럴 자격 있어, 내가 누리게 해줄게’라며 살살 어르고 녹이는 그들의 온화한 미소는, 그간 그런 ‘사나운’ 생각을 했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여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래도 싫은데요?’라고 삐딱선을 타면 괜찮은 남자들이 우리를 괜찮지 않은 여자로 보기 시작하는 건 한순간, 더불어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한 우리가 삐뚤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런 최적화된 유혹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도 여자의 본능 이전에 인간의 본능으로 미움을 느끼며 고통스러워지는데, 하물며 일상에서 그보다 훨씬 더 후진 ‘현실’의 남자가 가사·육아 분담도 잘 안 하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면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녀에게 가장 날것의 즐거움인 섹스조차 동참하지 않는다면, 즉 쉽게 말해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못 되고 있다면, 아니 도리어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치울 것, 챙길 것만 많아지는 짐이 되고 있다면, 여자들은 왜 여태 그 남자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일까?
임경선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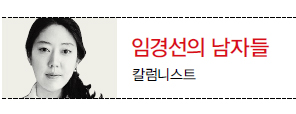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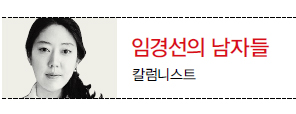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