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5.16 16:50
수정 : 2012.05.18 15:39
[매거진 esc] 임경선의 남자들
사람들은 소설과 영화를 함께 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곧잘 저울질한다. 소설 <은교>부터 읽고 영화 <은교>를 보았을 때 나는 품평할 여유를 잃었다. 내 마음을 꽉 채운 것은 그저 나이 든 이적요 시인의 적나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읽혀진 시인의 섬세하고 관능적인 내면세계가 스며든 손은, 눈으로 보니 단순히 핏줄이 튀어나온 검버섯 무늬의 손이었고, 시인이 입을 열어 고귀한 언어를 말하기 전까지는 엉성한 백발과 주름 가득한 피부, 엉거주춤한 동작과 쭈그러든 성기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이 듦은 죄는 아니지만 분명, 슬픔이다. 그나마 그는 시인이었다. 그것도 명망 있는.
현실의 나이 든 남자는 아무리 관대해진들 웬만해선 시적이긴 힘들다. 둘러보면 크게는 ‘기름진 두꺼비’과(실례)와 ‘건조한 식물’과(죄송)로 나뉘는 느낌이다. 전자의 기름진 타입들은 몸집이 불어 배도 나오고 두꺼운 금딱지 롤렉스시계 찰 것만 같고 그 나이 되도록 여자를 끊임없이 암컷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눈만 마주쳐도 임신할 것 같아 본능적으로 느끼한 시선을 회피하게 된다. 후자의 건조한 타입들은 나이 들면서 점차 중성적이 되어 수컷 특유의 위압감이 없어져 ‘할아부지’가 된다. 그러나 풀이 지푸라기처럼 되면 안쓰럽다. 남자의 나이 듦에 기름짐과 건조함의 절묘한 밸런스를 바란다면 너무 욕심일까? 이글대는 것도 싫지만 품행방정한 것도 어딘가 쓸쓸하다. 또 하나 점수 따는 지점은 ‘귀여움’. 물론 그들 스스로는 이 ‘귀여움’이 당최 뭔지 모른다. 나이 든 남자들의 귀여움을 제멋대로 포착해내는 것은 사실 젊은 여자들의 몫. 그러나 귀여움도 까딱하면 나이 들어 더 애처럼 철없어진다는 소문만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나이 먹었다고 세상에서 봐주는 건 대중교통수단쯤인 것 같다.
그럼에도 나이를 잘 먹은 남자의 멋을 한번 알고 나면 웬만한 연하 따위는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토로하는 꽤 괜찮은 여자들이 적지 않다. ‘이 남자라면 그 어떤 트러블도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 같은’ 믿음직함은 젊은 남자보다는 나이든 남자가 한 수 위임을 뭘 좀 아는 그녀들은 알고 있으니. 하지만 이 역시도 단순히 나이 들어 될 일은 아니고 ‘내게 맡겨!’라는 대사가 다부지게 어울릴 정도의 기백이 필요하다. 즉 일생을 통틀어 일구어낸 모든 걸 압축해서 바칠 각오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내면의 청년은 조금만 상처 입어도 노인의 껍질 뒤로 숨어버리고 만다. 그러고는 대충 알량한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로 마음 달래볼 궁리를 하니 이 애매한 욕구불만이 끼치는 사회적인 민폐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는 그냥 사랑이야.’ <은교>의 박범신 작가는 명언을 남기지만 그 마지막 승부를 시도할 남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희소가치가 그래서 더 치명적으로 매력적이겠지.
임경선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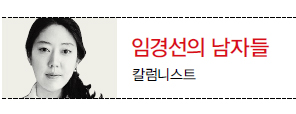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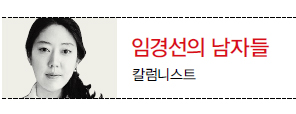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