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8.22 16:49
수정 : 2012.08.22 16:49
[매거진 esc] 임경선의 남자들
대학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그래서인지 전공과는 사뭇 다른 말랑말랑한 주제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일말의 계면쩍음이 있다. 대학 때도 부르주아로 보이던 시선에 대한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 나름 그걸 극복한답시고 의식적으로 과내 학회모임에 들었다.
‘제3세계정치학회’라는 곳이었다. 막연한 감으로 사람들이 왠지 버겁지 않아 들었던 그곳은 나중에 알았지만 다른 세 학회의 운동권 성향과는 의식적으로 거리 두던 학회였다. 물론 이쪽에선 거리 두기지만 저쪽에선 ‘제3세계’적 취급을 받았다. 나의 무의식적 지향성이라는 게 결국 잘해 봤자 그즈음인가 싶었다. 그래도 들락날락하는 동안, 최소한 휘둘린다는 느낌은 없었다.
여자가 적은 과라 과잉의 관심을 받아서인지 다른 학회의 존재감 강했던 남자선배들은 왜 내가 그 ‘비주류’ 학회에 굳이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해줄 문제도 아니었다. 기질상 한 이념의 기치하에 똘똘 뭉치는 것과는 천성적으로 멀었던 회원들 덕분에 학회는 얼마 안 가 단명했기 때문이다. 다른 학회의 카리스마 선배들이 총동문회에서 요란한 손놀림으로 찔러준 ‘대표’ 명함을 집에 와서 신나게 찢으면서 나는 ‘제3세계’의 그들이 대체 지금 어딜 가서 뭘 하며 사는지 궁금했다. 총동문회에 기름지게 나타나긴커녕 아마 어디 가서 자기 출신 학교도 안 밝힐 듯싶다.
나는 한국에서 ‘논객’이라는 남자들을 물끄러미 지켜볼 때마다 그 시절 그 제3세계 학회의 남자회원들을 떠올리게 된다. 운동 등 몸을 움직이는 것과는 담 쌓은 듯 독특한 체구를 가진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한국 정치사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그들이 푸는 설을 양손으로 턱 괴고 귀 쫑긋 진지하게 듣곤 했다. 이따금 눈썹을 치켜올리거나 얼굴에 홍조를 띠면 나는 그들이 속으로 퍽 흡족해함을 알 수 있었고, 유일한 여자회원이라고 특별대우를 의식적으로 안 했던 그들이었기에, 심리적 방어가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역시 싫지가 않았다. 뻣뻣하고 고집스런 ‘오덕’ 외양과 기본태도와는 달리 이런 여리고 의외로 쉽다는 취약점 때문에 훗날 자칫하면 이상한 여자들에게 엮이겠구나 싶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가장 사랑스러운 지점은 본인이 독특한 것을 본인만 잘 모른다는 점이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가 일반적인 호감의 전조라면 나는 이미 충분히 그들에게 매혹당했던 것 같다.
다행히 그들의 독자적 세계가 안드로메다까지 안 간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현란하고 매정하고 덜 인격적인 세 치 혀를 보였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조롱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기조롱 능력’을 이루는 것은 자기객관화와 유머감각일 텐데, 반대로 그것들이 결여되면 적신호 반짝, 전염병 환자처럼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외톨이로 전락하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였다.
임경선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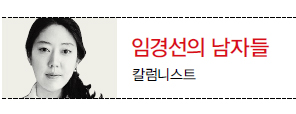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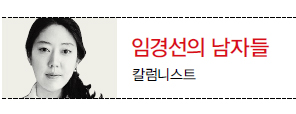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