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3.21 18:39
수정 : 2012.03.21 18:39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SPA 브랜드의 명품 컬래버레이션 가방 구매기
20년 전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창 프리미엄 청바지 붐이 일었다. 마리테 프랑수아 지르보, 닉스, 스톰 같은 것들. 당시에는 고가의 청바지였으므로, 카피 제품도 범람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품과 카피를 판정하던 재판관도 존재했다. 일종의 감별사 노릇을 하던 한 녀석은 포청천 같은 얼굴로 청바지 뒤편의 라벨을 뒤적거리며 정품과 카피를 구분했고, 가끔 카피 제품을 입고 와서는 정품인 척하던 아이들을 꾸짖곤 했다. “짝퉁이 브랜드 없는 것보다 더 후져.”
20년이 지난 지금, 요즘 에스피에이(SPA) 브랜드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에이치앤엠(H&M)이나 자라 등으로 대변되는 에스피에이 브랜드는 매 시즌 놀라운 속도로 신상품을 만들고, 싼값에 판다. 심지어 예쁘다. 패스트푸드와 비슷한 의미로 패스트패션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이렇게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복제의 달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에스피에이 브랜드들의 디자인 카피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심지어 일부 에스피에이 브랜드는 소위 명품 브랜드가 신상품을 내놓으면 거의 동시에 그 디자인을 베껴 제품을 출시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프라다의 스웨터와 흡사한 제품도 있고, 랑뱅의 팬츠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다. 그럼에도 가격은 10분의 1이 안 된다.
재밌는 건 이런 에스피에이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 라인이다. 이미 유니클로는 질 샌더와, 에이치앤엠은 랑뱅이나 콤데가르송 같은 고가 브랜드와 협업을 한 적 있다. 이 협업의 목적이 잠재 고객의 유치인지 다른 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매장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될 정도로 사람들의 호응이 높다는 것이다. 가격 싸고, 디자인 예쁘고, 결정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한발 걸치고 있는 옷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 걸 보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부의 규모가(그 축적 과정의 부도덕은 둘째 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의 규모를 뒤쫓고 싶은 욕망도. 그래서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처럼 ‘보이는’ 옷에 열광한다. 명품을 흉내 내는 에스피에이 브랜드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닐까.
 |
|
이기원 제공
|
내게도 운 좋게 이 반(半)명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얼마 전 에이치앤엠과 마르니라는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 라인이 발매됐고, 운 좋게 프레스 초청장을 손에 쥐었다. 나름 한산한 자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착각이었다. 개미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덕분에 쇼핑의 규칙도 까다로웠다. 조별로 20여명씩 입장이 가능하고, 제한된 쇼핑 시간은 10분, 단 하나의 제품만 구입 가능. 기다림에 무릎이 조금씩 저려올 때쯤 내 차례가 왔다. 튼실한 몸에 어울리는 사이즈의 옷을 10분 안에 찾기란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 대신 맘에 드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 값은 11만원. 싸다고는 말 못할 가격이었지만 공짜처럼 느껴졌다. ‘득템’한 것 같은 기분에 신용카드를 꺼내는 손은 경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가방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돈을 썼으면서도 돈을 번 것 같은 묘한 희열과,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한 시간을 기다려 이걸 사야만 했나 싶은 자괴감이 동시에 스쳤다. 갑자기 궁금하다. 20년 전 그 진품 감별사 녀석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니, 혹시 그 녀석도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아닐까.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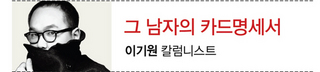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