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5.09 17:46
수정 : 2012.05.09 17:46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건축학개론’이 불러일으킨 시디의 추억, 시디플레이어 가격 이렇게 싸졌다니
뒤늦게 영화 <건축학개론>을 봤다. 세상 모든 남자의 첫사랑처럼 생긴 수지나, 지질했던 시절의 자신을 잔혹할 정도로 떠올리게 하는 이제훈의 연기도 좋았지만, 정작 눈길을 끌었던 건 휴대용 시디플레이어였다. 수지가 들고 있던 시디피(CDP)를 보며 속으로 외쳤다. ‘어, 저거 내가 쓰던 건데.’ 그 모델은 당시 시디피 시장을 평정했던 소니의 디(D)-777이라는 모델이다. 그 장면을 보며 감독의 고증이 참 꼼꼼했구나 싶었다.
1990년대 후반 즈음 잘나가던 시디피 시장은 급속하게 엠피(MP)3 플레이어로 대체됐다. 그럴 만했다. 엠피3 플레이어는 매번 시디를 바꿔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음악이 튀는 일도 없었으며, 휴대도 편했다. 음질이야 많이 떨어졌지만, 어떻게 듣느냐보다 얼마나 듣느냐가 중요한 시절이었다. 양심 따위 조금만 팔면 24시간 내내 다른 곡을 듣는 것도 가능했으니까. 한때는 용돈의 대부분을 시디 구입에 썼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엠피3에 익숙해진 채, 10여년을 살았다. 내 귀가 ‘사운드’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 그래미상을 수상한 리코딩 엔지니어 황병준을 만날 일이 있었다. 그는 시디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요즘 스테레오 방식도 아닌, 서라운드 방식으로 녹음을 하는 사람이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쉽게 가자고. 하지만 전 시디보다 훨씬 높은 스펙으로 녹음을 해요. 같은 음악이라도, 훨씬 듣기 좋거든요. 시디라는 매체가 최고라고는 못해도, 엠피3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는 직접 리코딩 엔지니어로 참여한 <송광사 새벽예불>과 <노던 라이츠>(Northern Lights)라는 음반을 틀어줬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제까지 듣던 것과는 깊이와 질감이 달랐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고, ‘듣는다’는 개념이 새로웠다. 좀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마음이야 진공관 앰프를 갖춘 값비싼 오디오 시스템이었지만, 돈도 없고 놓을 공간도 없어 우선은 작은 시디피에 투자하기로 했다. 황병준의 말처럼 시디로 듣는 것 자체가 색다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딱히 선호하는 모델 같은 건 없었던지라 인터넷 쇼핑몰에 시디피라는 단어를 쳐 넣었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다. 기본형은 4만원, 고급형은 8만원. 20여만원을 들고 수지가 쓰던 그 시디피를 사기 위해 부산 깡통 시장을 어슬렁거렸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시디피의 값이 시디 두세장 가격으로 내려와 있었다. 그만큼 수요가 없거나, 더는 성능 향상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
|
이기원 제공
|
딱히 큰 차이가 없어 보여 4만원대 시디피를 샀다. 소니의 ‘이제이(EJ)011’이라는 모델이다. 모처럼 책장 한구석에 보관해뒀던 과거의 시디들에 손이 갔다. 보관보다는 차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아마 마지막으로 구입했을 시디인 이소라의 7집 앨범을 꺼내 넣었다. 어떤 사람들은 엠피3과 시디의 음질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막귀의 입장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훨씬 비옥하고 풍성한 음질이었다. 한동안 볼 일 없었던 앨범의 속지까지 뒤적이다 그제야 알았다.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분간 먼지 쌓인 시디들을 다시 한번 들어볼 생각이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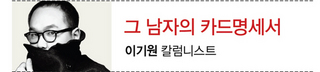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