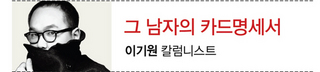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박력 넘치는 기계식 키보드, 사무실에서 쓰기는 소음이 눈치보여과거의 문인들에게는 붓이나 펜이 생계수단이었겠지만, 지금 내 생계수단은 키보드(와 노트북이)다. 프로 낚시꾼은 좋은 낚싯대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발사는 날이 잘 드는 좋은 면도기를 사는데 나는 그동안 이 생계수단에 큰 관심이 없었다.
키보드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나 싶었고, 계속 써오던 키보드에 큰 불만도 없었다. 나는 거의 4~5년간 에이치피(HP)에서 발매되던 528A라는 팬터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를 써왔는데, 이 보급형 키보드는 값도 쌌지만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타이핑의 감도 좋았다. 키보드가 고장나거나 수명이 다해도 굳이 다른 제품을 구할 필요 없이 항상 그 키보드를 구입했다.
얼마 전 키보드에 콜라를 쏟아버려 다시 키보드를 구입해야 할 때도 걱정이 없었다. 똑같은 제품을 사면 되니까. 그런데 맙소사, 이 키보드가 단종됐을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은 제품을 몇 개 더 사뒀을 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새로운 키보드를 찾아 용산 전자상가로 나섰다. 수많은 키보드 중에 하나 정도는 맘에 드는 제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사귀던 여자와 이별한 뒤 괜찮은 여자가 또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만한 여자를 만나기 힘들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후의 허탈함이랄까.
중고라도 구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던 중 우연히 ‘기계식 키보드’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기계식’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마음을 흔들었다. 뭔가 남자다워 보였고, ‘있어 보였’다. 생각해보니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프로게이머들은 꼭 기계식 키보드만 고집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았다.
검색창에 기계식 키보드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놀라운 세상이 나타났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진 키보드 전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키보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웠다. 커뮤니티 안의 사람들은 직접 부품을 사서 키보드를 튜닝하기도 하고, 서로의 키보드를 자랑하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지름신’이 강림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꼭 기계식 키보드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제품군 중 독일 체리(Cherry)사의 제품에 대한 평이 가장 많았다.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직접 매장에 들러 이것저것 살펴봤다. 기계식 키보드의 세상은 놀라웠다. 한 자 한 자 칠 때마다 말발굽 소리처럼 경쾌한 타자음이 귓가를 울렸고, 튕기는 듯한 키의 반발력도 맘에 들었다. 10만원 초반대에 덜컥 체리사의 입문용 키보드(사진)를 구입했다. 제품을 들고 집에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 키보드를 쓰면 당장이라도 대단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회사에 두고 쓰면 더이상 원고가 늦는 일은 없겠지, 싶기도 했다.
 |
|
이기원 제공
|
결국 집에서만 쓰는 모양이 됐지만 만족도는 꽤 높다. 기능도 그렇지만 그 다닥거리는 소리가 소작농들의 노동요처럼, 내가 지금 밥벌이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물론 뒤늦게 알게 된 아내는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 하는 거라고, ‘고작’ 키보드 사는 데 그렇게 큰돈을 쓰냐고 나의 소비를 힐난했지만 내 대답은 이랬다. “난 지금 밥줄에 투자한 거라고!”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