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6.06 18:06
수정 : 2012.06.06 18:06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찌는 사무실의 더위를 막기 위해 선택한 민합죽선…부채질 자체가 휴식이 된다네
재수학원에 다니던 시절, 반에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이 27살이었다. 갓 스무살이 된 내게 그 형은 어쩐지 세상을 달관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에게는 독특한 면모가 있었다. 개량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가 하면, 손에는 항상 부채를 쥐고 다녔다. 팔자걸음으로 느기적느기적 걸으며 손목에 스냅을 주던 그 모습에는 조선시대 한량 풍의 묘한 여유가 있었다. 그는 항상 에어컨보다 부채 바람이 더 시원하다며 부채 예찬론을 펼치곤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부채가 주는 유유자적한 분위기가 좋았다.
이후로 15년 정도가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지혜도 생겼고 수입도 늘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뚱뚱해졌다는 것이다. 당시에 비해 20㎏도 더 쪘으니 쌀 한 가마니를 몸에 얹고 다니는 격이다. 비대해진 몸은 체온의 상승을 불러왔다.
얼마 전 이직한 회사는 타는 불에 기름이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 문제였다. 대형 빌딩은 실내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 실내가 더웠다. 다른 사람들은 견딜 만하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인류에게 도움이 되자고 하는 일이니 불만이랄 것까진 없겠으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지옥에 떨어진 것 같으니 그것도 참 스트레스였다.
 |
|
이기원 제공
|
작은 선풍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까도 생각해 봤지만, 책과 필기구를 쌓아 놓기에도 책상이 좁기만 했다. 그때 문득 그 부채를 떠올렸다.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부채 하나만 있으면 에어컨 바람 따위 부럽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부채를 사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부채를 도대체 어디서 산단 말인가. 인사동이 잠깐 떠올랐지만 턱없는 가격에 데었던 기억이 떠올라 포기했다. 일단 손에 쥐어봐야 할 것 같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도 없었다. 수소문해 을지로에 위치한 바버샵에서 좋은 부채를 판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로 향했다.
직접 가서 목격한 부채는 생각보다 투박해 다소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주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는 우연히 전남 무형문화재인 접선장 김대석 선생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됐고, 그길로 선생이 만드는 민합죽선을 공수하게 됐다고 했다. 양반들이 쓰던 합죽선은 소재도 좋은 것을 쓰고, 부챗살에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는 등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반면, 민합죽선은 말 그대로 하얀 한지와 대나무 살로만 만든 서민용 부채다. 밭 갈다 잠깐 나무 밑에서 쉬던 이들의 노동을 위로해주던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헐거운 종이곽에 들어 있던 그 부채를 꺼내 부쳐 봤다. 선풍기의 직선적인 바람보다는 못했지만, 볼과 귀에 와 닿는 바람의 결이 달랐다. 만듦새는 정교하지 않았으나 소재가 튼튼해 보여 오래 쓸 수 있을 것도 같았다. 2만2천원이라는 가격이 적절하게 느껴졌다.
잠깐 일을 멈추고 부채질을 하는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시원하지는 않다. 사무실은 여전히 찜통이다. 하지만 부채질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묘한 휴식이 된다는 걸 알았다. 15년 전 그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사에서 한발 떨어져 나온 느낌이랄까. 시원함을 얻지는 못했으나 마음의 여유는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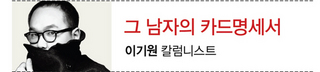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