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8.08 18:06
수정 : 2012.08.08 18:06
 |
|
이기원 제공
|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짠맛의 신세계를 알려준 게랑드 소금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서울에 와서야 내가 짠맛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내가 자란 고장의 음식이 꽤 자극적이라는 걸 알았다. 내겐 너무 슴슴하게 느껴지는 음식도 사람들은 간이 적당하다며 좋아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쩐지 ‘왕따’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다. 서울 생활을 꽤 했음에도 입맛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설렁탕을 먹으러 가도 남들보다 두 배는 소금을 뿌렸고, 식은 라면 국물을 좋아했던 것도 식으면 짠맛이 더 강해져서였다. 짜게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느니 하는 얘기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맛있는 게 더 중요했다.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뭔가 먹은 것 같지도 않았다.
얼마 전, 한 셰프에게 소금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소금은 자연산 천일염이 아니라 화학소금이며, 정말 좋은 소금을 먹어보면 맛이 다르다는 요지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 소위 명품 대접을 받는 최고급 소금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 좋다는 소금을 사기 위해 최근 강남에 문을 연 종합식료품 매장에 들렀다. 그리고 두번 놀랐다. 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싶어서 한번 놀랐고, 꽤 비싼 가격에 한번 더 놀랐다. 전남에서 생산된 국산 천일염도 있었지만, 우선 게랑드 소금을 사기로 했다. ‘외제’라면 죽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건 괜히 쌓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게랑드 소금도 꽤 종류가 많았다. ‘플뢰르 드 셀’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금은 125g 케이스의 가격이 1만원을 살짝 넘었다. 소금 1g당 100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잠깐 마음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에 이 소금을 쓴다면 아마 달걀보다 더 비싼 소금을 뿌리게 될 거였다. 1만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고작’ 양념이 원재료보다 비싸다는 생각에 이르자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이 있었다. 우선 저가형으로 보이는, 250g에 6천원 정도 하는 토판 천일염을 구입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소금이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집에 가서 곧바로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다. 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까지 극찬을 받는 건가.
달걀을 깨고, 연갈색 소금(흰색이 아니다)을 뿌렸다. 그렇게 달걀 프라이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곧바로 느꼈다. 정제 소금을 쓸 때와는 풍미가 달랐다. 이렇게 부드러운 짠맛이 존재할 수 있다니. 친구의 말대로 그건 짠맛의 신세계였다.
소금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최근 <게랑드의 소금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을 보면 게랑드 소금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다.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염전이 사라지고, 심지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발표되자 게랑드 주민들은 격렬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덕분에 정부의 계획은 무력화됐고, 게랑드는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직접 소금을 만든다. 말하자면 게랑드 소금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인 셈이다. 그 덕분에 이렇게 비싼 ‘명품 소금’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개발에 혈안이 된 고위 공직자들도 게랑드 소금을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다. 쩨쩨하게 음식에 뿌리지 말고, 큰 스푼으로 한입에 터억.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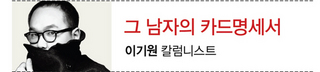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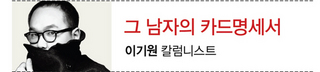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