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8.22 17:48
수정 : 2012.08.22 17:48
 |
|
이기원 제공
|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급제동 말 안들어 아찔했던 순간…애꿎은 브레이크만 탓했네
1년 전쯤, 9년차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제까지 잔고장도 조금 있었지만 아직 차의 존재 이유인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 특별히 부품을 교체해야 할 만한 일도 없었다.
얼마 전 새벽, 동호대교를 지나다 큰 사고를 낼 뻔했다. 새벽의 동호대교는 차가 거의 없어 규정 속도를 조금(사실은 많이) 넘어 달리기 좋은 곳인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급히 따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평상시 내가 예상하던 제동 구간과 차이가 컸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다행히 차가 멈추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영사기처럼 스쳐 지나간다더니, 정말 그랬다. 그 아찔한 순간이 지난 후, 중고차를 산 게 갑자기 마음에 걸렸다. 알고 보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차가 아닐까 싶기도 했다. 가끔 찾던 정비소를 찾아 우선 브레이크 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주인아저씨는 브레이크 패드는 아직 싱싱하며,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했다. 하지만 브레이크의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뭐였을까. 찬찬히 차를 살펴보던 아저씨는 셜록 홈스 같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문제는 이거였구먼.”
아저씨가 가리킨 앞 타이어는 보톡스 맞은 것처럼 미끈했다. 많이 닳아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생각해 보니 엔진오일이나, 배터리에는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정작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에는 무관심했었다. 아저씨는 이 타이어가 제동력 감소의 주범이었을 것이고, 빗길에 달렸으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모르며, 곧바로 여기서 타이어 4개를 교체하자고 얘기했다. 하지만 카센터에 유통되는 타이어에 대한 괜한 불신이 있었다. 재생 타이어 유통에 대한 내용을 어딘가에서 본 기억도 났다. 타이어는 아무래도 좀더 공식적인 곳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붙잡는 아저씨를 뿌리치고, 한국타이어에서 운영하는 공식 대리점으로 갔다. 굳이 그곳을 택한 건 ‘집과 가까워서’였다.
차를 검사하던 타이어 전문가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줬다(타이어에 제작일자까지 표시된다는 건 처음 알았다). 앞 타이어는 과연 마모가 심각했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건 공기압이라고 했다. 기준치보다 공기압이 많이 낮은 편이라 빨리 오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직원은 뒤 타이어의 상태는 괜찮으니 앞의 두 짝만 새로 교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모양만큼 값 차이도 제각각인 여러 가지 타이어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웃으며 말했다. 굳이 장거리 운전이나 거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기본형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말을 듣고 기본형보다 1만원 더 비싼(왜 기본형이라면 항상 뭔가 밑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타이어 한 짝을 23만원에 구입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난 뒤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아봤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 테지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타이어가 차체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말처럼 주행감이 좋아졌다는 건 아니다. 워낙 오래된 차였으니까. 다만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 줄어들었다. 직원은 한 달 뒤 공기압 체크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넣어주겠다고 했다. 나만 주의하면 당분간 그 짧은 필름을 보게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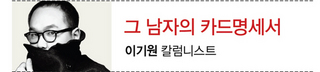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