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9.05 18:27
수정 : 2012.09.05 18:27
 |
|
이기원 제공
|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폐업 앞둔 동네 대여점에서 발견한 낡은 우라사와 나오키 전집
늘 지나는 한가한 퇴근길이 떠들썩했다. 가만 보니 상점 하나가 폐업 정리를 하는 중이었다. 근 1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던 동네 책방 겸 디브이디(DVD) 대여점이었다. 동네 대여점치고는 규모가 꽤 커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빌리러 자주 들락거렸는데, 어느 순간 발길이 뚝 끊어진 곳이었다.
출입문 앞에 유성 매직으로 거칠게 쓰인 ‘폐업 정리’라는 단어는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매장 안은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나도 슬그머니 그 행렬에 동참했다. 오랜만에 찾은 매장 내부는 지난 세월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했다. 반쯤 기울어지고 칠이 벗겨진 책장과, 이제는 촌스럽게 보이는 커버를 가진 디브이디들, 수많은 단행본과 만화책.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만화 코너였다.
늘 수요가 있는 인기작인 아다치 미쓰루의 [H2]나, <슬램 덩크> 같은 만화책들은 이미 누군가 선점한 뒤였다. 건질 만한 게 있나 싶어 두리번거리던 두 눈이 한 묶음의 책을 발견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던 건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사진)였다. 평소 좋아하던 작가였고,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해 읽었던 작품이었다.
반가움에 책을 집었지만 이런, 책이 너무 더러웠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빌려갔을지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책의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내지는 미끌미끌했다. 그냥 돌아서려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갔다. 가격을 묻자 주인은 풀 죽은 표정으로 ‘1만5천원’이라고 말했다. 한권이 아니라 총 18권의 가격이었다. 치솟는 건물 임대료와 끊임없이 생기는 경쟁 업체들 때문에 적자가 쌓였다고 했다. 한시라도 빨리 팔고 나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생각해 보니 활자로 이루어진 책은 구매했어도, 만화책을 직접 구입한 적은 거의 없었다. 만화를 좋아하면서도, 만화는 주로 만화방에서 소비하는 게 전부였다. 만화책을 ‘대여’가 아니라 ‘구매’한다는 개념이 낯설었기에 조금 망설였다. 만화를 이렇게 한번에 많이 사도 될까 싶었고, 18권이나 되다 보니 가뜩이나 빽빽한 집 책장이 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자꾸 1만5천원이라는 가격이 마음에 걸렸다. 1만5천원은 요즘 나오는 일반도서 한권 값이다. 아무리 손때를 탄 낡은 책이라 해도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았다. 주인은 2만원을 받고, 5천원을 거슬러 주려고 했다. 하지만 왠지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다른 책 한권을 더 구입하고 말았다.
그렇게 산 <몬스터> 18권을 집에 오자마자 홀린 듯 한번에 다 읽었다. 낡은 종이의 질감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많이 읽었던 작품임에도 이렇게 새로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여전히 훌륭한 만화였고 여전히 재미있었다. 그제야 내가 이제까지 두번, 세번, 오랫동안 다시 들춰보고 곱씹었던 ‘책’은 소설이나 시가 아니라 만화책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저녁,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만화책이 더 있을까 싶어 그 대여점에 다시 들렀지만 이미 철거작업에 들어간 뒤였다. 무너진 내벽 사이로 미처 다 팔지 못하고 버려진 책의 잔해들이 보였다. 그제야 좋은 공간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전해졌다.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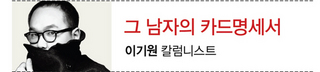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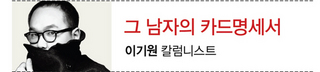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