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0.10 18:51
수정 : 2012.10.10 18:51
 |
|
이기원 제공
|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동물털로 만든 고가의 켄트칫솔이 서랍 속으로 직행한 이유
언제부턴가 양치질을 하면 잇몸이 붉어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잦았다.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물 잔해들이 이에 끼어 이쑤시개를 찾는 경우가 생기고(어릴 때는 이를 쑤시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싫었는데), 얼음물을 급히 들이켜면 잇몸이 아렸다. 당장 치과로 직행하는 것이 옳았으나 그건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싶었다.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약국에 가서 “인사돌 하나 주세요” 하기도 싫었다. 그건 왠지 처음 약국에서 콘돔을 사던 20대의 어느 날처럼 또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신호탄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칫솔이었다. 좋은 칫솔을 쓰면 이 유혈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오랫동안 한 브랜드의 칫솔만 써왔지만 어느 순간 그 질감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던 참이었다. 새로운 칫솔을 찾아 편의점과 마트를 꼼꼼히 뒤져보고, 괜찮다 싶은 제품은 보이는 대로 샀지만, 예민해진 잇몸에 딱 맞는 제품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병원과 인사돌 중에서 택일하려던 찰나, 친구에게 켄트라는 브랜드의 칫솔(사진)을 소개받았다. 실제 동물의 털을 가공해 만드는 칫솔이라고 했다. 동물의 털로 이를 닦는다니 뭔가 역한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동물보호가 전 지구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게 웬 역주행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나일론 칫솔을 선택하는 데 반쯤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으므로 호기심도 생겼다. 생산된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수요가 있다는 건 효용이 있다는 말이다. 폭풍 같은 검색 후에 켄트사가 18세기에 설립된 브러시 전문 브랜드라는 것과, 아직까지 이 회사가 동물의 털로 칫솔을 만드는 건 나일론 칫솔이 치아를 마모시키고 잇몸에도 썩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영국과 일본, 딱 두 군데서만 생산된다는 것도 마음의 허영을 부추겼다. 국내에 아주 소량 수입돼 있는 켄트의 제품군을 어렵게 찾아 오소리모로 만들어졌다는 제품을 구입했다. 가장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는 제품이었다. 밀봉된 케이스를 열자 검고 기분 나쁘게 생긴 칫솔모가 등장했다. 정말 구둣솔 같은 느낌이었다.
잘못 산 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엇보다 여기에 치약을 묻혀 입안에 넣을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하지만 8천원이라는 고가 상품이었으므로 떨리는 마음으로 치약을 묻히고 입안에 넣어봤다. 그런데 어라, 생각보다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아래위로 움직여봐도 예전 나일론 칫솔을 사용할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치약의 거품도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현대에도 여전히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번 정도 써본 후 더는 이 칫솔을 쓰지 않게 됐다. 양치질의 과정은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양치질의 가장 큰 기쁨인 개운함이 덜했다. 게다가 혀를 닦을 때는 이물감이 상대적으로 심하기도 했다. 결국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야 출혈은 멈췄다.
송나라의 문헌에는 쇠뿔로 만든 손잡이에 말 털을 심어 치아를 닦는 데 이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한다. 이후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짐승의 털을 이용해 이를 닦는 풍습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갖가지 인공염료와 당분 범벅인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개운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음식에 화학조미료가 들어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역시 화학 재료로 만들어진 나일론 칫솔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아주 씁쓸한 인정이다.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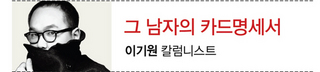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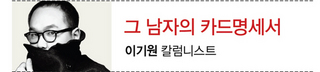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