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07 18:05
수정 : 2012.11.07 18:05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날렵한 몸체에 반해 구입한 아웃도어용 오피넬 나이프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뭉툭해진다. 지난 사랑이 그랬고, 생물학적으로 퇴화 단계에 들어선 육체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집 부엌칼도.
작은 주방용 칼을 쓴 지는 7년쯤 됐다. 누군가에게 선물받은 칼인데, 대단할 건 없었지만 굳이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칼이다. 칼이 전처럼 잘 들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건 꽤 오래전이었다. 하지만 대체로 주방용품 종류는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는 한 교체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한다. 매일 조금씩 군살이 쪄가는 것처럼, 불편에도 매일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났다. 국거리로 넣을 무를 자르려던 참이었다.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아 힘으로 억지로 자르려던 찰나, 뭔가 퍼뜩하며 식은땀이 흘렀다. 손가락 끝을 살짝 벴다. 왼손을 무 밑으로 너무 집어넣지 않아 다행이었지, 잘못했으면 손가락이 통으로 날아갈 뻔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소비를 위한 좋은 핑계가 생겼다. 새로운 칼을 고르는 데는 큰 고민이 필요없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나이프가 있었다. 아웃도어용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던 오피넬 나이프다.
 |
|
이기원 제공
|
이 나이프에 끌렸던 건 백년이 넘는다는 역사나, 프랑스제라는 타이틀이나, 절삭력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 모양 때문이었다. 길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손잡이와 칼날의 생김새는 몸이 예쁜 여자를 볼 때와 비슷한 쾌감이 있었다. 물론 고민도 있었다. 오피넬 나이프는 야외용으로 특화된 칼이다. 차라리 헹켈 같은 브랜드의 주방용 칼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게다가 나는 야영 같은 건 질색인 전형적인 도시 촌놈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야채를 썰거나 고기를 자르는 정도이니, 굳이 주방용 칼일 필요는 없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믿을만한 아웃도어 전문 매장에서 오피넬 8 모델을 구입했다. 칼날이 더 길고 두툼한 10이나 12를 구입하지 않았던 건 8의 그립감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 칼날을 펴고 찬찬히 살펴보니 살기가 대단했다. 당장이라도 산짐승의 배를 가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이 칼의 원래 용도를 짐작게 하는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만삭의 아내를 위해 필요한 건 산짐승의 내장이 아니라 전복죽이었으므로, 칼을 꺼내 전복과 당근을 도마에 올렸다. 꼭 새 칼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절삭력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오랜 시간 명성을 이어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디저트로 과일까지 깎고 나서야 아내에게 말했다. 칼을 샀다고, 정말 예쁘고 잘 드는 칼이라고. 하지만 아내는 예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역시 잊지 않고 한 방을 날려줬다.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이렇게 예리한 칼은 위험천만하다고. 게다가 나무 손잡이는 위생에도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결국 며칠 뒤 집에는 아내가 주문한 헹켈의 주방용 칼이 도착했다. 과연 오피넬보다는 주방 풍경과도 더 어울렸고, 플라스틱 손잡이도 더 위생적으로 보였다.
결국 오피넬 나이프는 주방의 안주인 자리를 뺏긴 채, 책상 아래 고이 모셔둔 관상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비록 매일 손에 쥐고 쓰지 못한다 해도, 가끔 꺼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3만원의 값어치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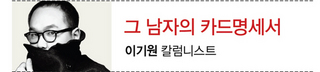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