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21 18:15
수정 : 2012.11.22 14:10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얼굴을 닦는 게 아니라 만져주는, 빨아도 새것 같은 홋토만 타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다. 산후조리원을 나오던 날, 원장은 날 붙잡고 귀띔해줬다. “집에 가시면 애 엄마한테 꼭 선물 하나 해주세요. 이럴 때 선물 하나 하면 평생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군.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던 건 아내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 아내의 노고를 치하해 마땅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내가 깜짝 선물을 하고 아내가 기쁨에 겨워 놀라 자빠지는 풍경이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였다. 차라리, 아내에게 물어보고 사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었다. 아내에게 슬쩍 물어봤다.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아내는 잠깐 골똘히 생각하더니, 김빠지는 대답을 내놨다. “아기 옷도 사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됐어 그냥.”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예전의 아내라면 위시 리스트가 당장이라도 100개는 나왔을 텐데. 하지만 출산은 아내에게 모종의 경제적 불안감을 심어준 것 같았다. 사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이긴 했다. 둘만 살 때와 비교하면 소비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저축률도 높아졌다. 하지만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까지 뺏기면 인생이 너무 비루할 것 같았다. 아내는 마지못해 말했다. “그럼 우선 좋은 타월이나 하나 사주든지. 애 목욕시키려면 배스타월이 필요한데 그건 깜박 잊고 준비를 못했어.”
백도 아니고, 힐도 아니고, 고작 타월이라니. 게다가 내게 타월은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 같은 느낌의 물건이었다. 타월을 돈 주고 사본 기억이 거의 없는 입장에서 돈 주고 사려니 아깝기도 하거니와 막막하기도 했다. 대체 어디 가야 좋은 타월을 살 수 있는 건지도 몰랐다.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타월이 좀 필요했다.(35년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는 여자들은 선물의 내용만큼 선물의 포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다.)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 같은 선배에게 물었더니 괜찮은 대답이 돌아왔다. 홋토만이라는 브랜드의 타월이다. 모든 공정이 일본 본토에서 이뤄지고, 자체 생산을 한다고 했다. 까짓거 얼마나 할까 싶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을 보고는 잠깐 뒷목을 잡았다. 일반적인 크기의 페이스 타월(세수수건) 한 장이 3만9천원이었고, 아이용 목욕수건은 6만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큰맘 먹고 페이스 타월과 아기 목욕용 타월, 키친타월을 구매했다. 대략 12만원 정도 들었다. 고작 수건 4장에 비교적 큰돈을 쓰고 나니 속이 쓰리긴 했지만, 막상 배송돼 온 수건을 보고는 마음이 좀 풀렸다. 포장이 예뻐 아내에게 줄 선물용 역할은 충분했고, 꺼내봤더니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감이 좋았다. 비싼 제품답게 만져보고 닦아보니 과연 촉감과 흡수력이 달랐다. 타월이 내 얼굴을 닦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대개의 수건이 세탁하면 사포처럼 뻣뻣해지기 쉬운데 이 수건은 매일 빨아도 처음 느낌 그대로다.
세상의 좋은 제품을 다 써보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하는 걸까 싶어, 잠깐 슬퍼졌다.
글·사진 이기원 칼럼니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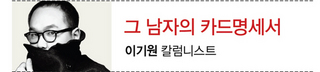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