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2.06 18:13
수정 : 2013.02.11 11:16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카이사의 대나무 귀이개
<코파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다. 코를 파는 행위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취미이자 오락거리이며,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는 가장 평등한 쾌락이라고 말하는 책이다. 패러디와 B급 유머로 가득 찬 이 책이 재미있었던 건, 내게도 코파기가 은밀한 즐거움 중의 하나여서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차마 팔 수 없어서, 혼자 있을 때만 판다. 코가 가득 차서 도저히 참지 못할 때는 화장실 같은 은밀한 곳에 가서 파기도 한다. 새끼손가락을 넣고 후비적거리다 커다란 덩어리가 툭 빠져나왔을 때의 쾌감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슷한 이유로 귀를 파는 것 역시 대단한 쾌감이다. 코를 팔 때보다 쾌감의 강도는 덜하지만, 묘한 차이가 있다. 코를 파는 것이 직구를 던져 삼진을 잡아낸 것 같은 기분이라면, 귀를 파는 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변화구로 잡아낸 삼진 같다. 코를 파는 것만큼 쉽게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지만 어려운 수 싸움 끝에 큰 덩어리를 건져냈을 때의 기분은 섹스 후의 카타르시스에 가깝다. <심야 식당>으로 유명한 만화가 아베 야로의 데뷔작 <야마모토 귀 파주는 가게>가 그 흔한 섹스 장면 하나 없이 묘하게 에로틱한 무드를 자아내는 건 그런 이유에서일지 모른다.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귀이개는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곁에 두고 써왔다. 대단한 제품도 아니었다. 동네 슈퍼에 흔히 파는 평범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귀이개였다. 겨울에는 금속의 차가운 느낌 때문에 귀에 넣을 때 깜짝 놀란 적도 있지만,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해온 제품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이 귀이개가 지겨워졌다. 어떤 이별이 그런 것처럼, 결정적인 이유 같은 건 없었다. 다만 새로운 귀이개를 써보고 싶었다.
 |
|
이기원 제공
|
귀를 파는 일이 비교적 일상화돼 있는 일본에는 오로지 나무 귀이개만 전문적으로 수공 생산하는 장인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뒤적거리면 실리콘 재질의 귀이개도 있고, 일반적인 스푼 형태가 아닌 쇠곤봉같이 생긴 귀이개도 있었다. 가장 맘에 든 건 장인이 만든다는 귀이개였지만 쇼핑몰이 아닌 사이트 자체에서 판매하는 거라 구매 과정이 복잡했고, 가격도 한국 돈으로 5만원가량 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고 싶은 물건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귀이개의 모양에서 너무 어긋나 있는 제품도 썩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일반적 모양인 스푼의 끝으로 귓속을 살살 긁어내는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민하다 구매한 건 미용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일본 카이(KAI)사의 대나무 귀이개(사진)다. ‘119’라는 이름이 붙은 이 귀이개는 대나무 재질의 귀이개 위에 새하얀 솜뭉치가 달려 있어 생긴 것도 예뻤다.
포장을 뜯고 당장에 귓구멍 속으로 귀이개를 넣었다. 과연 나무로 만든 제품이라 그런지 금속 귀이개보다 훨씬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다. 금속 귀이개는 잘못하면 고막을 뚫어버릴 것 같은 위압감이 있었는데, 이 나무 귀이개는 상대적으로 위압감이 적었다. 귓속을 긁어낼 때도 금속 귀이개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었다. 끝에 달려 있는 솜뭉치는 귀를 파는 과정에서 귓바퀴에 떨어지는 잔해를 없애는 데 유용했다. 여러모로 잘한 선택이라는 뿌듯함이 들었다.
나무 귀이개로 귀를 후비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귀이개는 그 종류가 참 많은데 왜 코파개는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 새끼손가락 이상의 도구가 없어서일까. 누군가 적당한 물건을 만든다면 분명 구입할 생각이 있는데 말이다.
이기원 <젠틀맨 코리아> 피처 에디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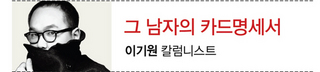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