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5.15 18:33
수정 : 2013.05.15 18:33
 |
|
이기원 제공
|
[매거진 esc] 그 남자의 카드명세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는 방법은 아주 쉽다. 이런 과잉생산 시대에 한번 산 물건을 또 사고 싶다면, 그게 개인에게 최고의 물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최고의 물건 중 하나는 와코루의 팬티다.
나는 속옷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변태여서가 아니다. 다만 마음에 드는 겉옷은 다 살 수 없으니 비교적 싼 속옷이라도 마음에 드는 걸 사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꽤나 다양한 제품을 구매했고 그중에는 밴드에 영문 로고가 큼지막히 박힌 꽤 비싼 제품들도 있었다. 하지만 한마디로 돈값을 못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아메리칸 어패럴의 속옷을 주로 입었다. 질감은 거칠었지만 가격에 비해 색깔과 디자인이 예뻤다. 몇 년 동안 애용하던 이 제품을 찾지 않게 된 건 아내와의 백화점 방문에서였다.
1년쯤 전이었다. 아내는 나를 데리고 여성용 속옷 매장으로 향했다. 영문으로는 Wacoal, 읽기는 와코루라고 읽었다. 일본 속옷 업체여서다.(과거 일본에서는 기모노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1925년 백화점 화재 때 왕실 여성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속이 다 보일까봐 구조를 거부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속옷 입기 운동이 생기며 창업한 기업이란다.) 와코루의 충실한 소비자였던 아내는 맘에 드는 속옷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가 어디론가 숨고 싶은 것도 모르고. 빨리 나가자고 고함을 지르기 직전에 아내가 말했다. “여기 남자 팬티도 파는데 하나 살래? 내가 사줄게.”
사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만 가격이 꽤 비쌌다. 팬티 한 장의 가격이 4만원이 넘었다. 이미 비싼 속옷의 품질에 적잖이 실망한 적이 있었던지라 마음이 가지 않았다. 이 팬티 한 장 살 돈이면 아메리칸 어패럴 팬티를 넉 장은 살 수 있었다. 여성 속옷 브랜드에서 파는 남성용 팬티라는 것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디자인이 유난한 것도 아니었다. 됐다고 손사래를 치는 내게 아내는 사감 선생 같은 표정으로 굳이 팬티 두 장을 안겼다. ‘일단 한번 입어보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 같은 심정으로 백화점을 나왔다. 그때까지 몰랐다. 가끔 새로운 세상이란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열리기도 한다는 걸.
마지못해 입었던 와코루의 팬티는 나를 신세계로 인도했다. 고작 팬티 한 장으로 내 하루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모아주고 받쳐준다’던 옛 브라 광고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이 팬티는 중요한 곳을 따뜻하고 듬직하게 감싸주는데다 활동도 편했다. 무엇보다 엉덩이와 생식기 주변에 닿는 감촉이 기가 막히게 부드러웠다.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 날에는 의식처럼 이 팬티를 꼭 입고 다닐 정도였다.
그렇게 1년 동안 와코루의 팬티를 요긴하게 써왔지만 얼마 전 세탁 실수로 팬티를 모조리 못쓰게 됐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결국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샀다. 이것보다 좋은 제품이 분명 있겠지만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거면 충분했다.
새로 산 와코루의 팬티는 여전히 비쌌고, 품질도 여전했다. 감정이란 조금씩 마모되는 거라 처음 입었을 때보다 행복의 강도는 옅어졌지만 매일 저녁 샤워 후 속옷을 갈아입을 때면 여전히 형용하기 힘든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정말 좋은 건 따로 있다.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골치 아픈 세상에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끝>
이기원 <젠틀맨 코리아> 피처 에디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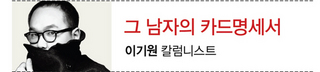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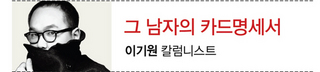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