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5.15 18:35
수정 : 2013.05.15 18:35
[매거진 esc] 서효인의 야구탓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 왔다. 2009년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선배들처럼 서울역에 내려 누가 코를 베어 갈까 잔뜩 긴장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들뜨지도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삶의 방향을 틀어놓고 생각해보니, 서울행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는 서울에 가야 완성이 된다. 지역의 젊은이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 후, 혹은 이직, 결혼 등의 갖가지 이유로 서울과 서울 근처로 흘러온다. 오염된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듯, 우리는 표정이 없다.
그해 응원하던 야구팀이 우승을 했다. 서울에 오기 전에는 맘만 먹으면 야구를 보러 갈 수 있었다. 도시는 작았고, 나는 바쁘지 않았으며, 야구장도 한가했다. 하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 도시는 컸고, 나는 시간과 돈을 내기 어려웠으며, 야구장은 멀었다. 처음 야구장에 들락거린 이후로 처음, 한 번도 직관을 못했다. 그러나 2009년 가장 야구에 의지한 해이기도 하다. 외로운 마음이 들자, 급격하게 야구에 기대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반지하 자취방에 누워 이종범 응원가를 부르다 잠들기도 했다.
김상현은 군산상고 출신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타이거즈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한다. 나와 비슷한 연배이니 비슷한 패턴으로 팬질(?)을 했을 것이다. 아버지 따라 경기장 가기,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들을 모아 야구장 가기, 어린이 회원 가입하기 등등. 그는 꿈에 바라던 팀에 입단했으나 곧 서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된다. 2군에서 크게 활약하지만 1군에서는 기량이 발휘되지 않았다. 그에게 기회는 그를 보냈던 팀이 다시 그를 찾으며 시작되었다. 다시 타이거즈로 돌아온 김상현은 연일 홈런포를 생산하며 극적인 활약을 펼친다. 나는 그의 타구에서 무형의 위로를 받았다. 크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그의 홈런 타구를 사랑했다. 낯선 곳에서 좌절하던 젊은이가 극적으로 고향 팀의 해결사가 되다니!
그는 며칠 전 다시 트레이드되었다. 엄밀히 말해 선수는 구단의 자산이고, 선수의 이동은 전적으로 구단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삼 프로의 비정함을 느낄 여유도 없다. 야구는 계속되고, 좋아하는 선수가 다음날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는 사실을 받아들일 각오 또한 당연하다. 다만 아쉬운 건, 팬은 선수와 팀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구단은 팬과 선수를 엑셀 파일 함수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다. 아니겠지? 엑셀을 한다면 이렇게 구단을 운영할 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아쉬움 하나 더. esc 연재를 오늘로 마친다. 연재를 하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나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 모두 좋은 일이었던 것 같다. 야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각자 삶의 전광판에, 아름다운 표정들을 찍으시길, 감히 바라 본다.
서효인 시인·<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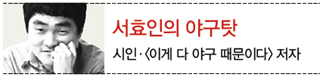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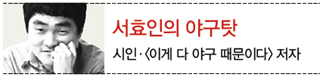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