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중비교] ③ 계열사 기밀비로 마련한 ‘회장님’ 비자금
현대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둔 ‘수확’ 가운데 하나는 재벌 비밀금고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 3월26일 서울 원효로 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비밀금고를 덮쳤다. 세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재벌의 비밀금고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미 그것으로 검찰 수사는 절반 가량 끝난 셈이었다. 현대차 퇴직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밀금고를 이렇게 묘사했다. 현대차경비쓴 것처럼 ‘허위전표’ 만들어
문서고 서랍장 밀자 현찰만 50억 “금고는 방 하나만 하다. 10평이 넘는다. 2003년에 만들어졌다. 문서고의 안에 내부벽을 하나 더 쌓아 공간을 만들었다. 그 앞을 돌리면 움직이는 서랍장으로 (금고의 존재를) 숨겼다. 서랍장 뒤 문을 열쇠와 카드키로 열고 들어가면 철문으로 닫힌 ‘금고 속의 금고’가 나타난다. 그 입구에 2평 남짓한 공간이 있고, 돈을 실어 나를 때 쓰는 가방이 비치돼 있다. 그곳에서 또 철문을 열면, 현찰로만 50억~60억원이 항상 보관돼 있었다.” 검찰이 덮쳤을 때 비밀금고 안에는 1만원권 현금 50억여원과 수표, 양도성 예금증서 20억원 등 모두 70여억원이 들어 있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현대차의 비자금 액수는 모두 1213억원. 현대차 본사에서 460억원, 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위아 682억원, 글로비스에서 71억원 등이다. 대부분이 회사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거짓 전표를 작성해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글로비스는 위장거래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수시로 몇억원 단위로 글로비스 비밀금고로 옮겨졌다.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 비자금을 정 회장 등 그룹 최고위층에 전달했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김동진 부회장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면 김 부회장이 계열사 고위 임원진에게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
비싸게 샀다고 꾸미는 ‘구매방식’
“재무팀 벽 안에 쌓아뒀다” 증언 그러면 삼성은 어떨까? 삼성 쪽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한번 당하고 난 뒤에는 비자금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삼성 퇴직자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관재팀에도 비밀금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비밀금고의 입구는 현대차의 비밀금고와 마찬가지로 벽으로 위장돼 있으며, 안에 들어가면 현금과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상품권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각 계열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몇억원씩 현금으로 비밀금고에 옮겨지는 것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이 돈은 적자를 내는 계열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용도 등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증언은 물론 ‘과거형’이다. 그는 “현대차 사건 등이 터지면서 비밀금고를 없애버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삼성 비자금 역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의 몇몇 핵심인물만 빼고는 내부 임직원들조차 그 규모와 방식을 짐작하지 못한다. 대선자금이나 ‘세풍 사건’ 수사 등의 과정에서 비자금의 분명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한번도 실체가 뚜렷이 드러난 적이 없다. 언론이 삼성 비자금 문제를 추적하는 일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들과 검찰 등의 광범위한 증언을 토대로 한 어려운 ‘그림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물품을 구입할 때 비싸게 산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구매 방식’이다. 시민단체에 양심선언 뜻을 비쳤던 한 삼성 계열사 퇴직자의 증언.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100원짜리면 130원으로 하고, 5원은 판매업체에 주고 25원은 비자금을 쌓는 식이었다.” 삼성 구조본 출신의 한 인사는 “비자금 문제에서는 삼성물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비밀 유지 및 품질 유지를 이유로 장비 도입이나 반도체 라인 증설 공사 등을 모두 삼성물산에 맡기고 있는데, 비자금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의 비자금 문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 수사 막판에 최도술씨한테 건네진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드러나는 듯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삼성그룹 전체의 비자금 규모는 구조본 안에서도 재무팀 쪽 핵심 관계자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본 김인주 사장은 1998년 11월 ‘세풍 수사’ 당시 97년 대선 때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자금 60억원의 출처에 대해 “계열사의 기밀비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엑스파일’ 수사에서는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2003년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 때에도 이학수 구조본부장(부회장)은 400억대의 불법자금 출처를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는 “구조본 재무팀이 관리하는 이 회장 개인재산은 주식만도 1조원이 넘는다”며 “회장이 신뢰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보고 없이 내가 알아서 쓴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불법자금이 회사 돈으로 드러날 경우 배임·횡령죄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둘러대기 의혹이 짙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일면의 진실은 있다고 삼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구조본 사람들은 삼성의 모든 것이 회장의 소유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각 계열사에서 끌어다 조성한 비자금도 당연히 ‘회장님 것’으로 믿고 있다.”(한 전직 임원) 비자금의 조성·관리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구조본의 별도 지부까지 설치돼 있는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구조본 출신 인사는 “구매 규모와 비자금 규모는 비례하는 법인데 일본 쪽에서는 구매하는 설비가 많은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비자금 임원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떼이기도
삼성의 모든 것은 ‘회장님 것’, 비자금도 ‘회장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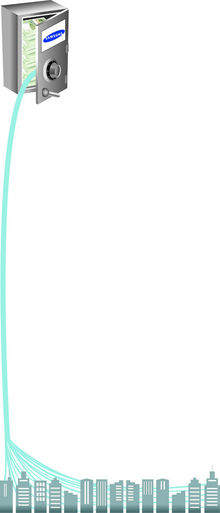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