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 우리가 잊어버린 할머니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인 첫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적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 사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해 왔다는 것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45년 해방 직후 신문들도 문제제기 1945년 해방 직후의 신문 등을 보면, “정신대로 끌려가 남양(남태평양), 중국 각처에서 일본인 장교의 위안부 노릇을 하던” 한국 처녀들의 ‘유혼’이나 ‘유골반환’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한-일 협정이 타결 막바지에 와 있던 시기에 이르러 더 분명해진다. 그 한 예로 <경향신문>은 1965년 2월17일치 ‘일본은 대답하라’라는 연속 보도의 첫 기사인 ‘호곡하는 넋’을 통해 일제가 저지른 대표적인 6개의 만행 가운데 “미혼 여자를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납치 동원하여 위안부로 만든 것”을 꼽고 있다. 이후 70~80년대의 8·15 특집기사에서도 일본이 책임져야 할 문제 중의 하나로 ‘정신대’(실질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참상을 반드시 거론해 왔다. 좀더 직접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것은 1982년에 발생한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 당시였다.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 대륙(나중에 동남아시아로 확인)을 ‘침략’했다고 쓰인 부분을 ‘진출’했다고 고치도록 한 이른바 ‘교과서 파동’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 당국이 발표한 10여개 항목 수정 요구 중에 ‘정신대’(사실상 위안부를 지칭)에 대한 기술이 포함돼 있다. 당시, 국사학자 최영복은 1982년 8월18일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여자 정신대라는 미명 아래 만 12~40살의 여성들이 강제 동원되어 일본의 군수공장이나 남양(남태평양)의 최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일부는 위안부로 전락됐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교과서 정신대 기술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신대의 기술 등 6개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곤란하다”고 통보한다. 1982년 9월 일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직접 여성지에 등장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는 기사가 등장하게 된다. 1982년 일본교과서 파동 때‘여성동아’에 실린 이남님 수기
면직원에 속아 랑군 위안소로
위안부 피해자 명단엔 없어 전쟁 끝난 뒤 못 돌아온 노수복
1984년 방콕에서 위성중계로
한국의 형제자매와 눈물의 상봉
배옥수는 ‘간호원 근무’에 속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커밍아웃’이 이뤄지기 9년 전에 자신의 위안부 피해를 공개한 이는 이남님이란 여성이었다. 그는 1982년 <여성동아> 9월호에 실린 ‘독점수기: 나는 일본군의 정신대였다/ 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를 통해 자신이 겪은 위안부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남님은 1927년생으로 전라남도 승주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만 17살이던 1945년에 마을에서 동네 친구 박순단과 함께 버마 랑군으로 강제동원되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동원 과정에 대해 마을에서 면직원과 구장이 “정신대는 군인들의 밥과 빨래를 하거나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월급이 40원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이남님의 부모가 솔깃해 자신을 구장에게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을 통해 조선의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면직원 등 일제의 행정기관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남님은 또 부모가 면직원 등의 ‘감언’에 속아 자신을 내준 이유에 대해 포로 감시원 등 이전에 일본군의 군속으로 동원된 이들이 집으로 50원씩을 보내왔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남님과 박순단이 승주군에서 여수에 도착하니, 또래 여자들이 100여명 정도 모여 있었다. 이후 순사와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달포’ 정도 배를 타고 버마 랑군에 도착했다. 랑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순단과는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남님은 랑군에 도착한 뒤 처음 있었던 위안소에서 보름 정도를 지냈다. 이후 자동차에 실려 다니면서 전선의 곳곳을 전전했다. 당시 랑군에서 위안부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다녔다. 이남님이 끼어 있었던 패에는 약 50여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남님 등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은 억류자 임시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그 안에 조선 여자가 200여명이 있었다. 이후 이남님은 1946년 5월 중순께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그곳엔 조선 여자가 300여명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남님은 1946년 7월 중순께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는 이후 인천에서 술장사, 작부 등의 생활을 전전하다 청주에서 대폿집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밝힌 이유에 대해 “꼭꼭 숨어 살다가 내 육신과 함께 비밀로 땅속에 묻어 버리려 했는데 내 과거가 탄로나 이렇게 여기에 털어놓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남님과 박순단은 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남님의 증언은 여성 잡지의 수기기사로 공개된 소극적인 고발이었다. 이에 견줘 노수복은 한국 언론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린 인물이다. 김학순 할머니 첫 증언의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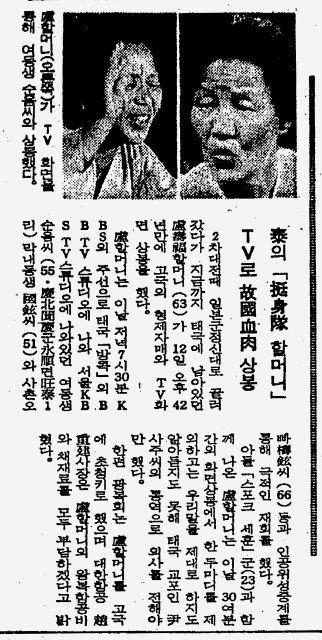 |
|
타이 방콕과 서울에서의 위성중계로 여동생과 눈물의 상봉을 한 노수복 할머니의 사연을 보도한 1984년 3월13일치 <동아일보> 지면.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