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인 여우원숭이. 위키미디어 코먼스
|
[토요판] 조홍섭의 자연 보따리
어릴 때 몇 번이고 읽은 동화책 <십오 소년 표류기>는 쥘 베른이 1888년 낸 모험소설로 원제는 ‘2년간의 휴가’이다. 15명의 어린이가 휴가차 탄 보트가 표류해 도착한 남태평양의 무인도에서 2년 동안 살다가 탈출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새로운 세계와 모험을 향한 동경은 소년의 특권이지만,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의 유전자에도 그런 성향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어떻게 동물들이 살게 됐을까 궁금해하다가 든 생각이다.아프리카 남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은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여우원숭이, 카멜레온, 바오밥나무 등으로 상징되는 이 섬의 동식물 가운데 약 90%는 세계 다른 곳에는 없는 고유종이다. 마다가스카르는 약 8000만년 전 아프리카와 분리됐다. 아직 현재와 같은 포유류가 진화하기 전 일이다. 그렇다면 이 섬의 동물은 어디서 왔을까.
1세기 전만 해도 ‘육교 이론’이 정설이었다. 아프리카에서 400㎞나 떨어져 있으니 헤엄치기엔 너무 멀고,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를 잇던 기다란 육교 형태의 육지가 한때 있다가 사라졌다면 동물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교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게 이 이론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게다가 유인원, 사자, 코끼리 등 대형 포유류는 전혀 없고 안경원숭이, 설치류, 몽구스 등 작은 동물만 있는 사실도 특이하다. 여기서 일찍부터 ‘뗏목 이론’이 출현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큰 홍수 때 나무나 작은 숲이 통째로 바다에 흘러간다는 사실을 안다. 실제로 폭 100m에 작은 물웅덩이까지 있는 큰 숲이 200㎞ 밖 바다에 떠내려간 일이 있다. 여기엔 뱀이나 쥐 같은 소형 동물은 물론이고 재규어, 퓨마, 사슴, 원숭이, 그리고 어린이까지 타고 있던 기록이 있다. 만일 해류가 도와준다면 400㎞라도 이동할 수 없는 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닷물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흐른다. 벽에 부닥친 뗏목 이론을 최근 지질학자와 생물학자들이 되살렸다. 판구조론 연구자들은 마다가스카르가 약 2000만년 전에는 현재보다 1600㎞ 남쪽에 있었고, 당시의 대륙 배치에서 해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마다가스카르 쪽으로 흘렀음을 밝혔다. 또 분자유전학적 증거는 이 섬에 있는 영장류 101종의 조상은 4000만~5000만년 전 한 종이 분화한 것임을 보여줬다. 큰 열대폭풍 때 쓸려나간 숲 조각에서 운 좋은 어느 영장류가 이 섬에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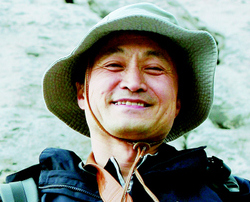 |
제주도처럼 빙하기에 육지와 연결되었던 섬에는 육지와 마찬가지 동물이 산다. 반대로 대양 섬인 울릉도에는 애초 포유류와 뱀, 개구리가 전혀 없었다. 한강처럼 큰 강이 동해에 있었다면 육지와 137㎞ 떨어진 울릉도로 ‘항해’를 시도한 동물이 있었을 것이다. 서해안 섬에 유독 구렁이가 많은 건 거대한 홍수와 동물판 ‘십오 소년 표류기’의 유산일까.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