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다산 생가, 묘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문화유적지 전경.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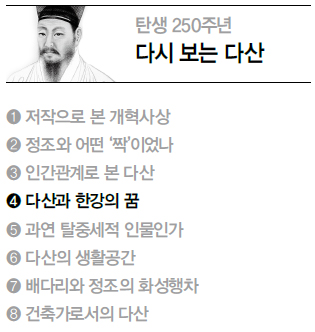 |
1801년 나이 40에 다다른 유배지 전라도 강진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때마다 그 마음은 한강으로 달렸다. 그곳은 부모형제, 처자식, 그리고 그의 님이 계신 곳이었다. 한강에 대한 향수는 유배지에서 소동파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렸던 <아미도>(峨嵋圖)를 본떠 손수 쇠내를 그리도록 하였다. “나도 지금 그림으로라도 쇠내를 보고픈데 이곳엔 화가가 없으니 누구에게 부탁할거나”라는 푸념도 그 마음을 꺾지 못했다. 그림에 서툴러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린 고향의 모습에 흡족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나마 머물고 있던 집의 윗목에 걸어두고 보았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리라. ‘푸른 산에 둘려 철마(鐵馬)가 서 있고/ 깎아지른 절벽 앞 왜가리 날아가며(동쪽에 쌍부암(雙鳧巖)이 있음)/ 남자주(藍子洲) 가에는 향기로운 풀 푸르고/ 석호정(石湖亭) 북쪽에는 맑은 모래 깔려 있네/ 바람맞은 돛배는 필탄(筆灘)을 지나는 듯/ 나루에 댄 배는 귀음(龜陰)으로 가는 듯/ 검단산(黔丹山)은 반쯤 구름에 들어 아득하고/ 백병봉(白屛峰)은 멀리 지는 해에 홀로 솟아 있네/ 하늘 아래 높은 산에는 절집 보이니/ 수종사(水鍾寺)와 잘 어울린다네/ 소나무·회나무 덮인 문은 우리 정자(望荷亭·망하정)이고/ 배꽃 한껏 핀 정원은 우리 집이네’(‘거칠게나마 그려본 쇠내’) 쇠내에 대한 마음을 담을 때, 한강집의 풍경이 머릿속에 펼쳐지는 것은 당연했다. 철마산·쌍부암·남자주·석호정·필탄·귀음·검단산·백병봉·수종사, 그리고 소나무·회나무로 덮인 망하정과 배꽃이 만개한 집, 그 이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은 더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마음만으로 그릴 수 있을 뿐…. “내 집이 저긴데도 갈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그림 보고 방황하게 한다”는 토로는 유배지에 묶인 처지에 대한 자위였을 게다. 한때 그는 강진에서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 1802년 겨울 세살 난 막내아들이 천연두로 죽었다는 소식이 강진에 들려왔다. 벌써 자식 다섯을 같은 병으로 앞세웠는데, 늦둥이까지 또 그랬으니…. 그것도 가는 길을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죽으면 기꺼이 황령(黃嶺)을 넘어 열수(洌水)에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흐느낌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
다산이 말년 고향인 한강 두물머리 강변에서 그린 <열초산수도>. 16일부터 7월22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산 탄생 250주년 특별전 ‘천명, 다산의 하늘’에 전시된다. 도판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제공
|
백성들 위한 왕도정치 구상
거대한 물줄기 품겠다는 꿈 그림으로 향수 달래던 유배
환갑 다돼 돌아온 고향땅서
미래의 꿈 꿨지만 펴지못해 다산에게 ‘왕도정치’란 거대한 담론이 아니었다. 그저 “넉넉하지 않지만 끼니걱정 없이 농사짓고 천륜을 즐기는 생활” 그것이었다. 고향 마을의 어부들과 같이 “두 자식을 데리고 소년 노릇, 동자 노릇 하나씩 맡겨 사는 것”이 꿈이었다.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왕정(王政)이 아니었다. “옛 성현들은 인정을 베풀 때 먼저 홀아비와 과부를 돌봤다지만, 그들은 매인 가족이 없었으니 굶어도 자기 한 몸 굶었을 뿐이다. 가족 돌아볼 걱정이 없다면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라는 말에는 왕정의 근본이 가족·백성에 있음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조선사회에서는 이것조차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18년 강진 유배생활 동안 열정을 다해 사유한 이유였다. 평생의 꿈인 민생을 위한 부국강병, 그 방책은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만나게 하는 데에 있었다. 그가 이용감(利用監)을 설치하여 북학을 전담하도록 구상한 것은 부국강병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육경사서’(六經四書)와 ‘일표이서’(一表二書)로 수신과 경세(經世)의 본말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치세와 ‘왕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겠다”(新我之舊邦)는 근본적 변법을 위한 작업이었다. 그사이에 몇 차례 해배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순간순간 절망했겠지만, 매번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래야 한강으로 돌아와 또다른 기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1818년 9월, 18년 만에 다산은 한강으로 돌아왔다. 50대 후반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미 늙어버린 몸뚱이와 덧없이 흐른 파란의 일생에 만사가 교차하였을 터다. 그러면서도 “남녘 땅 수천리를 노닐었으나, 쇠내와 같은 곳은 찾지 못했다”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읊었다. 다산은 강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에 근본을 두고 주례(周禮)를 바탕으로 한 유교 경전과 역사, 예법과 음악, 백성을 위한 병법과 농업, 의약의 이치를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일에 전념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1822년(순조 22년) 다시 태어난 느낌으로 회갑을 맞았다. 평생의 허물과 뉘우침을 씻어버리고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로 삼았다. 그는 매일 한강의 두 물이 큰물로 합쳐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학문 역시 그러하기를 바라고, 그 작업에 열중하였다. 유배에서 풀렸어도 평생 정리한 개혁방책들을 실천할 기회마저 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간의 저술을 다시 정리하고 이를 후세에게 전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적고 꾸짖는 사람만 많다면, 천명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 한 무더기 불 속에 처넣어 태워버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시대를 기다린다는 뜻의 ‘사암’(俟菴)을 자처하면서 거기에 그 절실함을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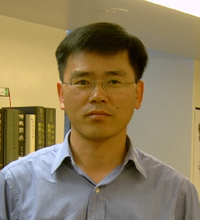 |
|
김성환/실학박물관 학예실장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