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30 18:35
수정 : 2013.01.30 18:35
 |
|
이대리 제공
|
[매거진 esc] 이대리의 직장생태보고서
1월 말 무렵의 회사들은 부서별 연간 예산 배분에 한창이다.
이는 곧 조직원으로서 한 개인에게 1년 동안 지속해야 할 갑 또는 을의 역할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가령 당신이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에서 비용을 사용하는 일을 맡았다면 ‘갑’으로 불릴 확률이 높을 것이고, 외부의 재화나 역량을 우리 것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을’일 가능성이 높다.
‘갑과 을’의 어원은 우리가 무의식중에 인식하고 있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육십갑자의 기본이 되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는 수평적으로 조합되어 각자의 의미를 창조하므로 서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단지 천간의 앞쪽 두 번째에 순서대로 있는 갑과 을이 우리 마음속에서 수직적으로 자리잡았을 뿐이다.
대학 시절 인도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바 있는 ㄱ사원은 관공서 인허가 취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 철에 즈음하면 ㄱ은 “그 여행에서 본 신분제도가 내 인생의 예고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자주 되뇐다. 자신의 신세가 새로 모시게(?) 된 ‘브라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벌벌 떠는 ‘바이샤’나 ‘수드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는 “갑오개혁 이후 ‘사농공상’의 신분제도가 점차 희석되어 왔다지만 이는 ‘농공상’ 사이에만 해당되는 말”이라며 “양반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경을 치는 ‘천한 것’들의 슬픈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며 자조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번째였다. 이는 남성 중심인 한국 경제의 반영이기도 하다. 대다수 한국 남성들은 직간접으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를 겪었다. 이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습관처럼 위계질서를 나누고 ‘갑과 을’을 구분짓는 계기로 작용했다. 재미난 것은 남편의 계급이 아내에게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것.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는 한 육아 커뮤니티에서 대기업 간부의 사모님을 자처하는 인물이 ‘추석 한우녀’로 등극한 바 있다. 남편의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쇠고기 선물 인증샷을 자랑삼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게시물을 철회한 이 사건을 철없는 한 아낙네의 자랑으로만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오물의 퇴적층 속에 콕 박힌 화석 같은 한국 사회의 단면이었기에 서러운 을들은 돌을 던졌으리라.
일반 기업의 경우 정년은 57살 전후, 나랏밥을 먹는 경우에는 63살 전후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1살 안팎이라 하니 우리는 갑도 을도 아닌 자연인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
이 20년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딱딱한 갑의 등딱지도, 두근 반 세근 반 뛰던 을의 새가슴도 온전한 내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되새기자. ‘수드라’ ㄱ에게 그렇게 무섭던 행정당국의 과장도, 칼 같은 일솜씨를 자랑하던 직속상관 ㄴ전무도 소속 단체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 언젠가는 소일거리 삼아 나선 등산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저씨가 아니던가?
“서열만 매기니까 멋이 없지, 등딱지를 벗어줘야 패션의 완성!” 요즘 인기 가도를 달리는 ‘전국구’ 행렬에 합류하는 방법이다.
H기업 이대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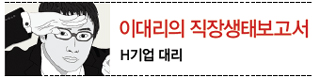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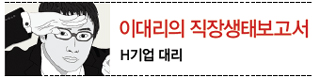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