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8.07 18:56
수정 : 2013.08.30 16:45
 |
|
이대리 제공
|
이 대리의 ‘직장생태 보고서’
얼마 전 회사가 진행하는 큰 행사의 입찰 진행을 맡았다. 세 업체의 실무자들을 모아 사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를 나눠준 뒤 4주 뒤에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통보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주 동안 각 대행사는 나름대로 최선의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담당자인 내게 많은 질문과 추가 자료 요청을 했고, 약속된 날 결기 어린 눈빛을 하고 모여들었다.
사내에서 관련 업무를 경험해본 7명이 심사위원석에 앉았다. 각자에게 배정된 발표시간과 약간의 휴식시간이 지나고 내 손에는 평가표 7장이 쥐어졌다. ‘안타까움’이라는 불필요한 인간미를 가미하지 않기 위해 엑셀 시트에 건조하게 점수를 입력해 나갔지만, 선택되지 못한 두 팀에는 ‘미안함’이 앞섰다.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유의 입찰에 ‘리젝트피’(Reject fee)를 지급한 바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리젝트피’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거절 수수료’쯤 될까? 그 의미는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에 지급하는 소정의 실비 보전 혹은 수고료 정도 될 것이다.
다음날 두 업체에 탈락 통보를 하려고 집어든 수화기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김 부장님,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주신 것 잘 알겠는데 간발의 차로 A업체가 선정됐네요”, “서 이사님, 제 맘 같아선 바로 계약서 쓰고 싶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 의견이 이렇게도 모이네요. A업체랑 하게 됐습니다”라고 운을 뗀 나는 “리젝트피도 챙겨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인연으로 함께 일하길 바랍니다”라는 공통된 문장으로 두 통화를 끝냈다.
며칠 뒤 선정된 A업체 실무진과의 만남이 있었다. 내내 꺼림칙했던 마음에 “경쟁 프레젠테이션 참가하시고 떨어졌을 때 리젝트피를 챙겨주는 곳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라고 물었다. 20년간 행사대행업에 종사한 A업체 ㅈ이사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시비를 막기 위해 탈락한 제안서를 저작권료 지급 개념으로 구입하기도 하지만 그 금액이 실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사기업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설명인즉슨 대형 이벤트일수록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고, ‘그 바닥’에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일감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이란다. 이어서 그는 “어떤 기업이 나서서 리젝트피 지급을 관례화해봤자 ‘좋은 기업인 척하는구나’라는 반응만 나올 뿐 산업계에 자발적으로 확산되진 않을 거예요”라고 덧붙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판매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랄 일과 바라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짓고 있었다. 짐작건대 그들이 받지 못한 정당한 보수는 입찰에 성공한 뒤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들로 변신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를 요청한 기업 입장에서 봐도 이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국인데 누구도 이 피곤한 반복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만일 2014년 예산 편성 요구안에 ‘리젝트피’ 항목을 신설하자고 나서면 나는 ‘우수사원’이 될까, ‘돈키호테’가 될까?
따지고 보니 리젝트피도 안 주는 회사들인 주제에 사회공헌 사업은 저마다 하고 있다. 선(善)함은 풍년이고 도리(道理)는 흉년이다. 그 풍년도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H기업 이대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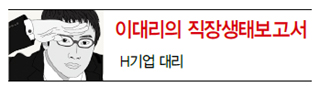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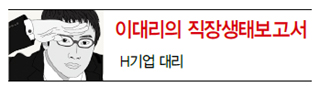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