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25 19:57
수정 : 2013.12.26 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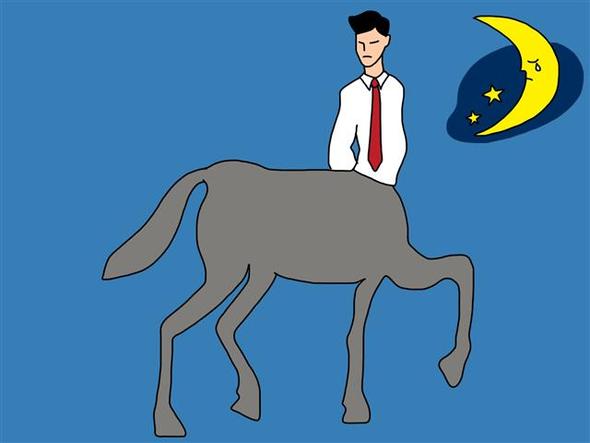 |
|
사진 이대리 제공
|
[매거진 esc] 이대리의 직장생태보고서
언제부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라는 것이 생겼다. 처음 들었을 땐 참 좋았다. 공식적인 휴일을 제외하고도 1년에 열흘이 넘는 휴가를 쓰도록 권장하겠다니 말이다. 지난해부터는 아내의 회사에도 생겼다. 단, 조건이 있었다. 의무사용일수를 근속연수에 따라 할당하고 그만큼 쓰지 못하면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 단순 계산으로도 부장급 정도면 연간 보름 이상을 쉬어야 했다. ‘유럽인들은 매년 장기간 먼 곳으로 휴가를 떠난다더니 우리도 이제 슬슬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턱도 없는 상상을 잠깐 해보긴 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 법.
매 분기가 시작될 때면 인사팀은 개인별 연차 사용 계획서를 걷는다. 그리고 분기 말이면 팀별 연차 소진율을 공개한다. 흥미로운 점은 소진율이 낮은 조직의 ㄱ팀장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은연중에 어깨에 힘을 주더라는 것이다. 회사는 고무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관계로 사상 최대치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 예상되지만, 바로 그 자신이 ‘위기 경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계획서상 표시된 날에 휴가를 쓰고도 출근한 직원들이 많았으며, 그만큼 연가보상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효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시간을 훔친 대가일까? 엄밀히 말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ㄱ팀장은 올 연말 승진이 유력시된다. 그리고 인두 자국처럼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다. “휴가는 내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10월 말이면 어서 의무사용 연차를 소진하라는 인사팀의 닦달은 심해진다. 이쯤 되면 휴가라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닌 회사를 위한 또다른 의무로 바뀐다. 소진 임박 시점에는 ‘병목 현상’도 심해진다. 한 팀에서 여럿이 휴가 날짜를 겹치게 쓰기도 힘들뿐더러 전사의 적체휴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관계로 휴양시설 이용마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12월에도 몇몇은 ‘반휴반출’(半休半出)의 상태로 지냈다. 마치 사무실의 켄타우로스처럼 말이다.
남산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멋지다. 그리고 그 야경을 만드는 사무실 불빛 속에서 ‘반휴반출’의 켄타우로스가 되어 서울을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밤늦도록 꼬박 20년을 넘게 일한다 해도 내 집 하나 갖기 힘들고, 무엇보다 20년 넘게 근속할 수 있는 회사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부서 특성상 야근과 휴일 출근을 밥 먹듯 하는 동기는 신입사원 시절 “급여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눴더니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랑 거의 같더라”고 말했다. 요즘은 “직급과 연차 때문에 미국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말한다. 몇 년이 지나면 유럽의 패스트푸드점 정도가 되려나? 문득 우리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는 선진국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체휴가제가 시행되고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 또 어떤 변종 근무가 등장할까? 그 또한 창조경제일까? 몇 번을 미룬 늦은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장 용종 몇 개를 떼어내고 즉시 야근전선에 투입된 ㅇ차장이 연가보상비나 제대로 받았더라면 병원비에 보탬이라도 됐지 싶다. 남의 시간이나 돈, 건강 모두 절대 훔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이 정도 기본이라도 잘 지켜졌으면 한다.
H기업 대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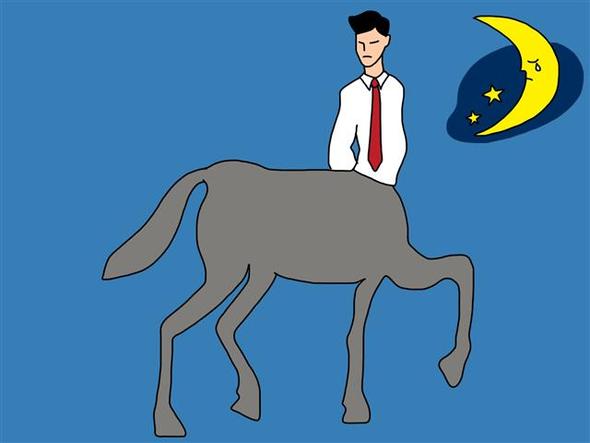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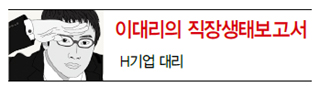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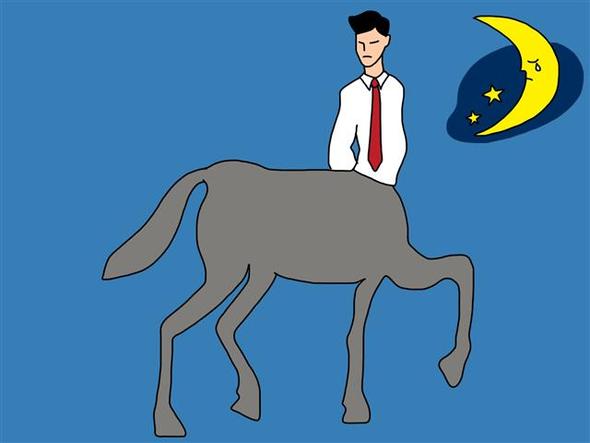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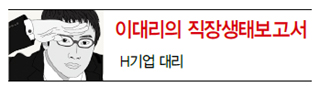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