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sc] 이대리의 직장생태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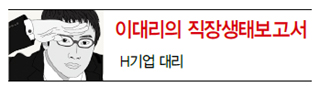 |
|
|
노동자 없으면 소는 누가 키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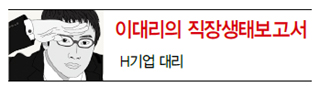 |
bjchina123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EuiQKIM RT @qfarmm : [포토]42년 만에 최악 가뭄···위성사진으로 본 소양강댐 http://t.co/BMpS2UjVoq http://t.co/r4OxEINQ1z
LAST_Korea RT @cjkcsek : [사설] ‘어린이 밥그릇’까지 종북 딱지 붙이나 홍준표의 유치한 종북몰이는 자신의 ‘저질 정치인’ 면모만 부각시키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http://t.co/XxOwP51oyK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할머니들도 ‘기껏 1번 찍어줬더니 아그들 밥값 가지고…’ 성토”http://t.co/ukHxPKTNnm[오마이] 홍준표, '해외골프' 뒤 첫 출근길에 비난 펼침막http://t.co/xn…
HillhumIna RT @jmseek21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 http://t.co/whlFjwWSl9
CbalsZotto 보궐선거용 거짓 립서비스~ “ @shreka3880 : ‘세월호 피해자 가족’ 챙기기 나선 새누리당 http://t.co/tfkk6gGEci 세월호 진상조사나 방해나 하자말라”
cess0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까요.http://t.co/RyPp5DzeRr[미디어오늘] 유가족들 우려가 현실이 됐다http://t.co/coAAtDbtRQ
sookpoet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리키로http://t.co/UMzV2bA4hY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