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권이 최고의 아동·청소년 복지다]
④ 자식 사랑과 인권 사이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 자신의 자녀가 머리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부모들은 학벌로 계급이 나뉘어지는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떠민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부모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끝없이 되묻는다. 교사이자 소설가인 한기평(필명)씨도 그런 부모 가운데 한 명이다. 한씨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고민은 그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아들에게 부친 어느 아빠의 편지
아들, 기억하니? 아빠와 처음 만난 비 내리던 여름날을.
네가 세상으로 오던 날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병원 창밖으로 억수같이 퍼붓는 빗발을 보며 아빠는 너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명은 경이롭다. 더구나 새 생명의 탄생은 한 사내의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다.
아빠는 이제 막 곁으로 온 너를 우돌이라 불렀다. 십만 원을 주고 작명소에서 새 이름을 지어온 뒤에도 소주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진 날이면 아빠는 너를 우돌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 이름 속에는 아빠의 환희가 들어 있다.
그로부터 열 몇 해가 흘렀다. 어느덧 너는 아빠보다 몸집이 큰 여드름 투성이의 소년이 되어 있었다. 처음 너를 만나던 날 너는 웃고 있었다. 웃고 있는 너를 보며 아빠는 다짐했다. 저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겠노라고. 맑게 웃는 아이에게 웃음을 잃지 않게 해 주겠노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너는 지금…피곤하다.
아침 5시50분. 너는 눈을 뜬다. 쓴 입맛을 다시며 닭 모이만큼 밥을 먹고 너는 집을 나선다. 거리는 미명 속이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정류장에는 가방을 든 아이들만 웅성거리고 있다. 저쪽에서 눈을 비비는 친구들과 멋쩍게 인사를 나누고 너는 버스에 오른다. 먼저 버스를 탄 아이들은 머리를 파묻은 채 졸고 있다.
 |
|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
닭 모이만큼 밥을 먹고 집을 나서
수업에 방과후학교 또 학원으로 밤늦게 퀭한 눈으로 집에 온 너
“안쓰럽지만 누구나 하는 거니까”
아빤 안쓰러운 감정을 억누른다 너와 뛰어놀던 게 언제였는지…
나와 내 가족만 잘살길 바라는
사내로 변한 아빠는 부끄럽다 우린 ‘잘 살기’ 위해 조급하다
어떤 게 잘사는 건지도 모르면서…
행복한 세상은 정말 불가능할까? 누가 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7시20분은 네가 자리를 잡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다. 어둠을 뚫고 집을 나섰지만 7시20분은 네가 종종걸음을 쳐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규범의 벽이다. 자습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하나 둘 쓰러진다. 책상은 좁지만 드넓은 침대가 된다. 너의 눈에도 활자는 몽환적인 그림으로 너울거린다. 종이 울린다. 흐린 정신으로 1교시를 맞이하고, 또 그놈의 알량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 선생님들은 점령군처럼 교실로 들어선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은 너에게 절망을 가르친다. 들어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너는 수면과 각성 사이를 넘나들며 시간과 사투를 벌인다. 하루는 정확하고 규칙적이다. 점심을 먹고 너는 하루의 끝을 기다린다. 시간은 더디게 흐른다. 4시30분. 집을 나선 지 열 시간이 지났지만 하루는 계속된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이름의 수업이 기다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너는 쿨하게 권리를 포기한다. 60분의 아침자습과 빈틈없이 짜인 350분의 정규 수업. 70분의 방과후학교.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이 나라 제일을 꿈꾸는 자율형 공립고에 운 좋게 들어간 너는 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드러내 놓고 경쟁을 부추기는 너의 학교는 냉혹하다. 너를 사육하는 학교는 질량의 면에서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을 줄이면 곳곳에서 독을 품은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이다. 물론 480분의 학습노동이 하루의 끝은 아니다. 애석하게도 엄마들은 너희가 좀 더 긴 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러 주길 원한다. 휴식권이 있다. “학생은 건강한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이 조례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수사임을 너는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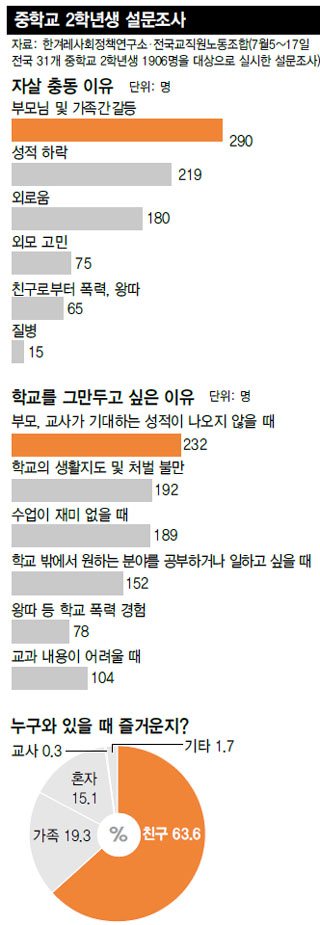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