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2.20 17:49
수정 : 2013.02.21 14:06
 |
|
이동미 제공
|
[매거진 esc] 이동미의 머쓱한 여행
방 끄라짜오
방콕을 다섯번 넘게 가봤지만, 방콕 안에 섬이 있는 줄은 몰랐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같은 곳인데, 고층빌딩이 많은 번화가가 아니라 방콕에 마지막 남은 ‘자연 여행지’로 통하는 곳이다. ‘방 끄라짜오’(Bang Krachao)란 섬이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한다. 최근 이곳에 생긴 자연친화형 호텔에서 묵기 위해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누리집에서 본 호텔 전경이 근사했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호텔 쪽의 노력이 상당히 진지해 보여 기대가 컸다.
하지만 우선 호텔까지 가는 길부터 너무 힘들었다. 방콕에서 한달간 살기 위해 꽉꽉 채워온 여행 가방을 이곳까지 안 끌고 가기로 결정한 나 자신이 한없이 기특해질 정도였다. 산파웃 선착장에서 탄 ‘스피드 보트’는 노를 저어 가는 건가 싶을 만큼 느리고 작고 열악했다. 사정없이 튀기는 짜오프라야 강물을 뒤집어쓰면서 배는 무사히 호텔 앞에 도착했다. 호텔 선착장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긴 것은 쓰레기였다. 수상가옥처럼 강물 위에 세워진 호텔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호텔 주변의 수상가옥도 처지는 비슷했다. 뭔가 잘못됐지 싶었다. 일그러진 내 얼굴이 보였던지 ‘방콕 트리하우스’의 주인이 설명했다.
“방콕 중심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강물 따라 흘러오다 이 섬에 쌓입니다. 방콕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몇십 년 전 방콕 시내도 딱 이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네 안에는 아직 순수한 자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호텔은 쓰고 있는 전기를 모두 태양열과 풍력 발전으로 자체 해결하는 자연친화형 숙소였다. 한 사람이 묵을 때마다 매일 1㎏의 쓰레기를 없애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객실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도 냉장고도 갖춰놓지 않았다. 또 자연친화형 호텔답게 수많은 벌레와 개미들도 객실에 함께했다. 호텔은 이 벌레들을 죽이는 일체의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쓰지 않고 있어, 하룻밤 만에 내 다리는 모기 물린 자국투성이가 됐다. 호텔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잠깐 나갔다가 잘못 든 길에서는 개 세 마리의 공격을 받아 물릴 뻔했다. 이 섬에서는 집마다 개를 키우는 편인데(우리네 시골 마을처럼), 낯선 사람이 집 쪽으로 들어서자 엄청나게 짖어대며 나를 향해 돌진하는 거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헬프 미!”를 연발했다. 개들도 나의 비명에 놀랐던지 잠깐 주춤했고, 그때 나는 아주 서서히 뒷걸음질 치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개들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사실 이 호텔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정글의 법칙에 버금가는 모험이라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곳에는 도심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섬 전체가 정글이라 할 정도로 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늪이 살아 있었다. 호텔 벽을 기어오르는 연둣빛 뱀에 기겁했고, 밤이면 생전 처음 듣는 온갖 새들의 울음소리에 이불을 힘껏 끌어당겼다. 호텔 유리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방이 달라붙었다. 늪에서는 작은 악어도 봤다! 세상에, 이게 방콕 같은 대도시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나 한가? 사람들이 방 끄라짜오를 왜 방콕의 마지막 남은 푸른 심장이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동미 여행작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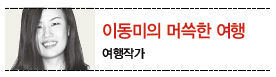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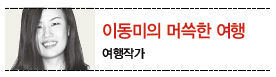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