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10 18:11
수정 : 2013.04.10 18:11
 |
|
이동미 제공
|
[매거진 esc] 이동미의 머쓱한 여행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보르도 지방으로 와이너리(포도원, 포도주 양조장) 투어를 떠났을 때 일이다. 포도주 라벨로나 보던 메도크와 생테밀리옹 지방을 실제로 여행하며 유명 와이너리에 들러 카브(와인창고)도 둘러보고 포도주 시음도 하는 멋진 시간을 보냈다. 그중에서도 중세의 마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생테밀리옹(사진) 지역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이곳의 와인스쿨에서 특별한 포도주 수업을 받게 되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일단 잔에 따른 포도주의 색깔을 보고 연도를 구분하는 법과 포도주에서 나는 향을 알아맞히기 위한 냄새 구별 테스트가 있었다. 9개의 작은 통에 담긴 향을 각각 맡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작은 노트에 적으면 되는 거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9개의 냄새 중 딸기향 하나만을 맞혔다. 냄새를 맡으면서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막상 떠오르지 않았다. 9가지 향의 종류에는 꽃·식물·과일·광물질·동물·향신료, 그리고 말린 과일과 불에 탄 냄새, 화학적인 향이 포함된다. 사물을 보지 않고 냄새로만 맞힌다는 것이 의외로 어렵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다. 이래 가지고는 건강한 흙의 아로마가 느껴진다든지, 은은한 송로버섯의 향이 난다든지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흉내도 낼 수 없겠다. 블랙커런트 향, 젖은 양털 냄새, 삼나무 향, 액세서리로 쓰는 호박(먹는 것 말고) 냄새 따위를 내가 무슨 수로 맞히겠는가. 소나무도 아니고 삼나무, 그냥 양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젖은 양털 냄새를 어디서 맡을 것이며, 어떻게 계속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평소 후각에 대해 신경을 쓰고 의식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훈련을 하고 찾아다닌다면, 똑같은 일상도 더욱 특별하고 풍성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겠구나 하는.
캐나다의 동부 맨 끝에 있는 프린스에드워드 섬(<빨강머리 앤>의 무대가 된 곳)에 갔을 때였다. 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고 9시쯤 그곳을 나왔다. 레스토랑 앞에는 아주 넓은 정원(이라기보다는 초원)이 있었는데, 우리를 인솔한 관광청 직원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다.
“킁, 킁,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아? 킁킁.” “냄새?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킁킁. 아! 스컹크 냄새다! 조심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스컹크가 있어. 냄새를 사람한테 쏘기도 하니까 컴컴한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마.”
스컹크가 방귀를 뀌면 냄새가 엄청 독해서 숨을 쉴 수 없다고 배웠다, 동화책에서. 그런데 실제로 맡아본(직접 맡은 방귀 냄새는 아니었지만) 스컹크 냄새는 생각처럼 고약하지는 않았다. 그냥 조금 독특한 향이 나는 듯했다. 내가 또 냄새에 둔한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한국인은 스컹크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스컹크의 방귀에서는 썩은 달걀, 마늘, 그리고 태운 고무 향 등이 섞여 나는데, 한국인은 그 은은한 마늘 향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란다. 여행의 냄새가 특별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세계 냄새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이동미 여행작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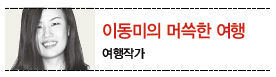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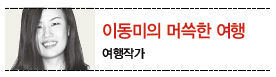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