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5.22 19:40
수정 : 2013.05.23 15:11
 |
|
요코하마 고가네초의 옛 홍등가. 이동미 제공
|
[매거진 esc] 이동미의 머쓱한 여행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흥미진진한 공간을 여럿 가봤다. 헬싱키에는 오래전 감옥으로 쓰였던 건물을 호텔로 개조한 곳이 있는가 하면, 도축장이 모여 있던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는 뉴욕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과 바가 모인 동네가 됐다. 뒤셀도르프 부근의 작은 도시, 오버하우젠에는 굴뚝이 엄청나게 높은 가스 저장고를 아트홀로 바꾼 신기한 곳도 있다. 맥주공장이나 낡은 창고를 레스토랑이나 바로 개조하는 것은 이제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도 민망한, 흔한 일이 됐다.
독창적인 콘셉트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간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홍등가를 예술촌으로 바꾼 곳들이었다. 베를린과 요코하마에 이런 동네가 있는데, 베를린의 포츠다머슈트라세와 요코하마의 고가네초가 바로 그곳이다.
1920년대부터 불과 십여년 전까지 홍등가와 마약거래소로 유명했던 포츠다머슈트라세는 현재 베를린에서 가장 핫한 갤러리 지역으로 대접받고 있다. 홍등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지 오래이고, 지금은 번지수 70~100 사이에 20곳이 넘는 갤러리들이 생겼다.
요코하마의 고가네초는 베를린보다 더 흥미롭다. 서울의 미아리나 용산역 부근처럼 250여개의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던 이 동네는 2005년 이후 빈 채로 방치되다가 요코하마시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엔피오(NPO)가 관리를 맡으면서 작가들의 작업실과 거주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고 한다. 오래된 홍등가의 낡은 집들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이 없었고, 홍등가라는 편견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예술만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다고 말하는 엔피오 담당자의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고가네초에는 ‘촌노마’(Chon-noma)라 불리는 작은 홍등가 집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무심코 골목으로 들어섰다가 보았던 용산역의 빨간 조명 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집들이다. 이곳에는 현재 작가들의 스튜디오와 갤러리, 다섯명의 건축가가 만들어낸 다섯개의 하쓰네 테라스 등이 들어서 있다. 정기적으로 벼룩시장과 바자 아트 페스티벌 등도 열린다. 동네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아기자기한 카페와 디자이너들의 옷가게, 운치있는 중고서점들이 들어섰고, 원래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상인들도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연일 굴착기가 동원되던 용산역의 휑한 풍경을 지날 때마다 나는 고가네초의 그 작은 골목들을 떠올리곤 했다. 모조리 부수고 갈아엎은 땅에, 번뜩이는 빌딩들이 당장 들어설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지금은 답답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 예술조차 들어설 수 없게 된 땅, 이제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다.
이동미 여행작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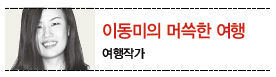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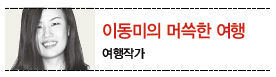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