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8.07 19:35
수정 : 2013.08.08 10:15
 |
|
이동미 제공
|
[매거진 esc] 이동미의 머쓱한 여행
동유럽 기차 여행을 다녀왔다.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시작해 크라쿠프, 체코의 프라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까지 이어지는 바쁜 여정이었다. 크라쿠프에서 프라하까지는 야간열차를 탔다. 밤 10시에 출발한 기차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 프라하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동유럽 기차는 예상했던 대로 서유럽이나 북유럽 기차보다는 시설이 좀 떨어졌다. 유레일 패스로 끊은 1등석임에도 객실에서는 살짝 찌든 담뱃내가 나고 침대칸은 낡았다. 작년에 헬싱키에서 로바니에미로 가는 북유럽 야간열차를 타본 적이 있어 더 비교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국의 야간열차에는 뭔가 막연한 낭만과 고독이 있어서 기분이 은근 설레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객실 문을 잠그는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열쇠 구멍은 있는데 키를 받은 적도 없고, 침대칸 어디에서도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내 옆방에는 네 명의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침대칸이 신기한 듯 열심히 객차 안 사진을 찍고 남의 칸도 기웃거리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안녕, 우리가 자는 이 침대칸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니? 혹시 열쇠 받았니?”
“오! 그거 좋은 질문이구나. 우리도 열쇠는 안 받았는데. 안내원한테 물어봐야겠는걸. 근데 안심해. 우리는 네 방에 안 들어갈 거니까. 하하하.”
서로 잠시 깔깔대다 체구가 건장한 남자 안내원에게 물었다. 그는 너무나 간단하게 ‘없다’고 말했다. 나처럼 방을 혼자 쓰는 여행객은 화장실을 가느라 방을 비울 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를 부르란다. 자기가 봐주겠다고. 그가 머무는 사무실은 마침 내 방 바로 옆이었는데, 그렇다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를 부르기도 참 거시기한 일이지 않은가. 객차 안에 콘센트는 왜 작동을 안 하냐는 물음에는, 40년도 더 된 기차에서 뭘 바라냐는 깔끔한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참다참다 새벽 1시쯤에 한번 그를 불러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시 오줌이 마려울세라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기대 글을 좀 쓴다거나, 밤 기차에서 느껴보려던 낭만은 언제 마려울지 모르는 오줌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 40년 된 기차는 초고속 열차처럼 빨리 달렸지만, 대신 소음도 컸다. 잠자리는 편안했지만 기차가 달리는 소음 때문인지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머리가 멍했다. 어느 지점에서는 내리막길을 가는지 ‘어이쿠’ 소리가 날 만큼 기차가 ‘출렁’했다. 하지만 피곤했던 나는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새 아침. 화장실에 가서 냉큼 세수를 했다. 눈곱도 안 뗀 얼굴로 안내원 아저씨를 부르기가 민망해서 그냥 다녀왔는데 어느새 소리를 들었는지 복도에 나와서 망을 보고 있다. 그런데 맨 끝 방에서 자고 있던 후배가 오더니 비통한 얼굴로 얘기했다. “선배, 방 안에 물 나오는 싱크대가 있는 걸 몰랐네. 저 책상을 올리면 밑에 싱크대가 있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야 발견했어요.”
어쩐지! 내가 흠뻑 젖은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안내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나쁜 사람, 도대체 왜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준 거니!’ ‘개콘’의 인기 대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각자 따로 방을 썼던 우리 일행들은 그렇게 싱크대의 비밀을 안고 기차에서 내렸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고 내린 것도 아닌데, 허무한 마음이 저 기차역 끝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동미 여행작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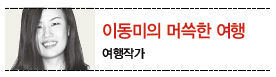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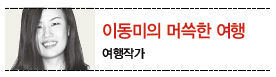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