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9.25 20:12
수정 : 2013.09.26 13:44
 |
|
인도 실롱의 축제장에 모인 사람들. 이동미 제공
|
[매거진 esc] 이동미의 머쓱한 여행
인도 북동부에 있는 실롱을 둘러보고 어느덧 떠날 시간이 되었다. 이제 부지런히 출발을 해도 구와하티(아삼주의 최대 도시)까지는 네댓 시간을 꼬박 가야 한다. 하지만 이곳까지 온 과정에 비추어보면, 6~7시간도 훨씬 더 걸릴 게 틀림없다. 가이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번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 적이 없다. “몇 시간이나 걸리나?” 물어보면 늘 “서너 시간”이란다. 하지만 매번 그가 말한 시간의 배 이상이 걸렸다. “아직도 멀었나?” 하면 거의 다 왔다, 안 멀다, 언제나 “노 프로블럼!”이었다.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빨리 떠날 마음에 안달이 나 있는데, 가이드가 또다른 제안을 했다.
“오늘은 실롱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메갈라야주의 주요 부족인 카시족이 주최하는 농크렘 축제인데, 1년에 한번 열린다. 이 축제를 본다면 당신들은 정말 억수로 운이 좋은 거다!”
역시나 시간이 문제였지만, 축제장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가이드의 말을 믿고(미쳤지!), 일행은 축제가 열리는 스미트 빌리지로 향했다. 성대하게 열리는 축제라고 하니 한편으론 보고 싶은 마음도 동했다. 이 축제에서는 마을의 풍년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여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주요 의식이 펼쳐지는데, 그 의식이 바로 오늘 열린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나 30분은커녕,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매년 11월에 닷새 동안 열리는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길은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꽉 막혔고, 차 타기를 포기하고 걷는 사람들의 행렬은 어두운 밤, 순례자의 행렬처럼 끝이 없었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걷는 사람들이 차 불빛에 비칠 때는 흡사 좀비 떼처럼 보였다.
결국 우리는 늦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농크렘 댄스도 보지 못했고 제사의식만 가까스로 볼 수 있었다. 운동장처럼 드넓은 빌리지 안에, 수백명 아니 수천명은 돼 보이는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 12명의 카시족 대표들이 맨 앞줄에 일렬횡대로 앉아 제물을 들고 있었다.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염소라고 했는데, 염소가 아닌 닭을 들고 있었다. 마을 중앙에 모여 아무런 흥분도, 감동도 없이 닭 피를 짜고 있는 카시족의 의식은 솔직히 초라하고 황당해 보였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군중의 맨 앞자리로 진군했던 한국의 이방인들은, 뒤에 앉은 실롱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잔돌 세례만 받았다. 몇 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앉은 자신들 앞에 우리가 앉아서 앞이 안 보인다는 거다. 콩알만한 돌들이 끊임없이 등짝으로 날아왔다. 일행은 결국 사진도 못 찍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야 했다. 화려하고 신비로운 농크렘 댄스도, 성스럽고 경건한 염소 제물의식도 보지 못했다. 일행은 그저 ‘우린 대체 뭘 본 거지?’ 하는 상태가 되어 힘없이 마을을 되돌아나왔다.
피곤함이 묻은 침묵 속에 일행 중 하나가 말을 꺼냈다. “아까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뒤에 있던 어떤 남자애가 실롱에 진짜 괜찮은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알려줄까 하고 물어봤어” 하며 피식 웃었다. 이 산중 마을 실롱에 나이트클럽이 있다는 것도 안 믿겼지만, 그런 말을 축제장에서 들은 것도 웃겼다. 불현듯 실롱의 젊은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어떻게 춤을 추고 놀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전속력으로 새까만 밤길을 달리고 있었다.
이동미 여행작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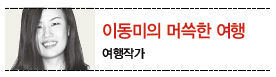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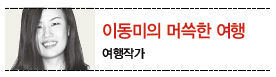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