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04 20:27
수정 : 2013.12.05 12:00
 |
|
각종 허브로 만든 전통 약을 파는 스위스 아펜첼의 오래된 약국. 이동미 제공
|
[매거진 esc] 이동미의 ‘머쓱한 여행’
브뤼셀에서 발가락에 금이 갔다. 친구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았다가 바퀴 안으로 발이 끼어 들어가서 왼쪽 둘째 발가락에 금이 간 것이다. 응급실에는 나보다 더 급한 응급환자들이 몇 명 먼저 와 있어 세시간여 만에 내 차례가 됐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둘째 발가락 마디가 반 이상 금이 가 있었다. 너무 아픈데다 외국에서 다쳐본 게 처음이어서 무척 놀라고 무서웠다. ‘깁스를 하겠지? 이 발로는 못 걸어다닐 거야. 이대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유럽에서의 일정이 2주 이상 남아 있던 나는 두렵고 심경이 복잡했다.
그런데 브뤼셀 병원의 의사는 엄지발가락을 지지대 삼아 둘째 발가락과 함께 반창고로 둘둘 말더니 그만 가보란다, 알약이 한 알씩 담긴 약봉지를 쥐여주면서. ‘엥? 그럼 나 가도 돼? 깁스 안 하는 거야?’ 너무 간단한 조치에 순간, 나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사실 별일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한쪽 발엔 운동화를 신고, 다른 발엔 호텔 슬리퍼를 신은 채 베를린 가는 기차를 탔으니까.
유럽에서는 사실 병원이나 약국에 가도 약을 잘 안 준다. 목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유럽의 약국에서 약을 달라고 하면 늘 목캔디를 주거나 허브로 만든 젤리를 주었다. 정 심해 보이면 목구멍 안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약을 준다. 절대 두세알 이상의 먹는 약은 안 준다. 유럽 사람들도 약을 잘 안 먹는다. 감기에 걸려도 허브티나 마시지, 저절로 나을 때까지 콧물을 달고 산다.
하지만 강력 항생제에 이미 내성이 생긴 한국인들한테 그 허브 젤리가 들을 리 없다. 그래서 가끔 겨울에 출장을 갈 때는 평소 다니던 내과에서 감기약을 열흘치 정도 지어 비상약으로 가져가곤 한다. 한번은 베를린에서 현지 친구와 저녁을 먹은 뒤 약을 먹으려고 한국에서 지어온 약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 알록달록한 색의 알약들이 네다섯개 쏟아졌다. 그 약을 보더니 친구가 기겁하며 나에게 물었다. “너 무슨 심각한 병 있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친구는 나를 암환자 취급 했다. 한국에서는 감기 걸려도 이 정도 약은 먹는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며 그 약이 무슨 약인지는 알고 먹는 거냐고 되묻는다. “글쎄, 콧물 줄이는 약, 열 안 나게 하는 약, 약이 세서 위가 아플 수 있으니 위를 보호하는 약…” 여기까지 대답하다 말았다. 솔직히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하니까.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나는 심한 몸살감기에 걸렸다. 으슬으슬 추운 것이 아플 기미를 보이더니,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줄줄 흐르고 콧물까지 흘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훌쩍거리고 있는데, 가이드인 롤랑드 아저씨가 슬로바키아의 전통 허브술을 권했다. 이 술을 먹으면 감기가 똑 떨어진다는 것이다. 술은 매우 독했다. 샷 잔에 가득 따라 나를 주었는데, 두잔 마시라는 걸 한잔만 겨우 원샷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절하듯 잠을 잤다. 그래서 감기가 나았느냐고?
다음날 아침 용변을 보는데, 설사처럼 기름 똥이 나왔다. 고약한 허브 냄새도 섞여 있었다. 힘든 아침을 보내고 나서야 다행히 감기는 나았다. 몸도 한결 개운해진 느낌이다. 전통 허브술 덕분일 것이다. 어쨌든 외국여행 때 마땅한 약이 없을 때에는 현지의 비법을 따르게 된다. 반신반의하지만 오랫동안 그곳 사람들이 이용해온 민간요법이니 믿을 수밖에.
이동미 여행작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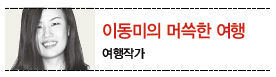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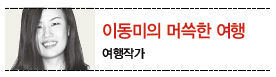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