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30 18:26
수정 : 2013.03.11 15:51
 |
|
‘맥레닌’ 티셔츠가 바람에 날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 최명애 제공
|
[매거진 esc] 수상한 북극
상트페테르부르크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읽기 시작했다. 한 달이 넘어도 여전한 이 ‘멘붕’을, 뭔가 엄청나게 위대한 것으로부터 위로받아 건너가고 싶었다. 책 뒤표지를 보고 잘 골랐다고 생각했다. 쩨쩨하게 ‘48주간 베스트셀러’, 이런 게 아니다. ‘인류 역사상 쓰인 가장 위대한 소설’이란다.
러시아 촌구석의 어느 조그만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자꾸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생각났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개도 있고, 물도 있고, 뭔가 노란색인데…. 208쪽을 지날 때 번개처럼 기억이 살아났다. 도스토옙스키가 작정하고 앉아서 이 책을 쓴 곳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였다. 바로 이 자리, 이 책상이라고 주장하는 조그만 박물관과 책상도 있다. 그 집 벽이 노란색이었나. 아니, 노란색은 푸시킨 박물관 벽 색깔이었나.
어쨌거나 도스토옙스키와 위대한 문호들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정말로 말을 못 해 고통을 겪었다. 10여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영어 병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여행 외국어’가 나오는 가이드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펴들고 지하철에 앉아, 내가 가려는 정류장의 이름을 러시아 알파벳으로 간신히 찾고 나면, 이미 몇 정거장 전에 지나가고 없었다. 압권은 헬싱키행 기차였다. ‘H’로 시작하는 기차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출발 3분 전에야 ‘X어쩌고’가 출발하는 플랫폼으로 달려갔다. 러시아어에서는 X가 ‘ㅎ’이다!
도스토옙스키인지 푸시킨인지 위대한 문호의 박물관에서 매표소 직원과 싸운 일도 잊을 수 없다. 성이 난 것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얼굴이 벌건 직원은 ‘15.00’이라고 종이에 써서 들이댔고, 나는 ‘오후 2시40분 기차를 타야 해서 3시 가이드 투어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길게 줄을 선 뒷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할 때쯤, 마음씨 고운 뒷사람이 어깨를 톡톡 쳤다. “저기, 15루블 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말 못할 고통이 너무 커서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아름다운 도시다. 엄청나게 우아하고 화려하다. 별 볼 일 없는 귀족도 영국 여왕보다 화려한 집에서 산다. 공기 입자에서도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저절로 플레이되는 곳이었다. 심지어 몹시 크기까지 했다. 베를린, 런던, 파리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는, 정녕 대륙의 도시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보니까, 도시가 끝이 없었다. 저 높은 곳을 준엄하게 가리키고 있는 소비에트풍의 조각상들을 보면서, 채 떠나기도 전부터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면서 지금도 생각한다. ‘네바 강의 얼음이 대포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는 봄이 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고 싶다고. 러시아를 두번 여행한 콜린 서브런이란 작가가 그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아주 추운 밤에는 말이 얼어서 땅에 떨어진다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말들은 봄이 되면 되살아나는데, 그래서 봄은 짝사랑하는 연인들의 수줍은 목소리와 지나간 소문들로 가득하단다. 그 전에 러시아 말을 배워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최명애 <북극 여행자> 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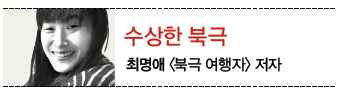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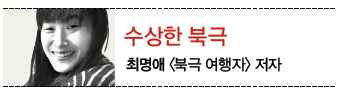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