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3.20 18:22
수정 : 2013.03.20 18:22
[매거진 esc] 수상한 북극
‘북극선을 따라서 여행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듯 한쪽 눈을 찡긋하며, ‘비싸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비싸다. 정말 비싸다. 어쩌자고 나는 별생각도 없이 북극선을 따라서 여행하기 시작했을까. 물가 싸고 인심 좋은 적도도 있는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춥고 배고픈 북극권의 마을들은 대체로 더럽게 비쌌다. 광산이 망해 광부들이 떠난 기숙사, 창문을 열면 이끼 낀 방파제가 반겨주는 배, 발목이 침대 밖으로 빠져나오는 2층 침대, 남은 침대와 의자를 한방에 다 쑤셔넣고 도미토리라고 주장하는 호스텔, 이런 곳들을 하룻밤에 20만원씩 주고 잤다. 변태 취향이어서가 아니다. 마을에 숙소가 하나이거나, 여럿이더라도 문 닫은 곳이 부지기수였다. 비싸다고 항의했다간, ‘그럼 5만원 더 얹어’라고 말할 기세여서, 조용히 울면서 돈 내고 잤다.
 |
|
뭉크의 <절규>가 그려진 포스터.
|
그렇지만 북극권 여행이 전적으로 죽을 만큼 비싼 것만은 아니었다. 숙소와 교통편은 확실히 비싸지만 밥값과 입장료엔 거의 돈이 안 들었다. 싸다고는 안 했다. 돈 쓸 데가 없다는 이야기다. 식당이랄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있어도 일찌감치 문 닫고 저녁은 안 파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는 북극의 대자연은 언제나 공짜였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알래스카 출장을 갔다가, 사력을 다해 썼지만(죄송합니다) 출장비가 너무 많이 남아 울며 겨자 먹기로 반납한 적도 있다. 물가 고려해 한 끼 1만원으로 식비를 책정했는데, 열흘 동안 사 먹은 게 고작 네 끼였다. 라면과 즉석밥, 에스키모 원주민 상회에서 파는 한국 컵라면이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다.
그러나 이런 ‘어찌 생각해 보면 반드시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는 북극권 여행’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다. 오슬로는, 아무래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시인 것 같다. 숙소와 교통수단이 비싸다는 북극권 일반 법칙을 충실히 따르나, 밥값과 입장료는 낼 게 없다는 일반 법칙에는 코웃음을 친다. 식당은 아무 때나 먹으러 오라며 밤늦게까지 흥청거리고, 테마파크와 박물관도 천지다. 북유럽 3국이 비슷한 이유로 모두 비싸지만, 그것도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순서로, 왼쪽으로 갈수록 더 비싸다.
배고픈 채 오슬로 기차역에 내렸다가 슬피 후회했다. 역 안에서 파는 조각 피자와 샐러드에 콜라 한 병을 사 먹었을 뿐인데, 4만원 넘는 돈이 훌쩍 지갑에서 나갔다. 도둑놈들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 한 병이 7000원, 맥도널드 햄버거 세트가 1만6000원 하는 나라다. 왜 이렇게 비싸단 말인가. 오슬로엔 중국산이 없단 말이냐. 오슬로 국립대에 있다는 박노자 교수를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어졌다. 내 안의 파시즘을 발견해서가 아니다. 도대체 이 비싼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싶어서다.
그래도 오슬로가 어떻더냐고 물으신다면, 좋았다고 대답하겠다. 쓴 돈이 아까워 억울해서라도 좋았다고 ‘정신 승리’하려는 게 아님을 믿어주길 바란다. 예쁘고 깔끔한 도시다. 사진과 똑같다. 왕궁이며 거리는 적당히 복고적이고 적당히 현대적이며, 여름의 공기는 햇볕에 말려 놓은 빨래처럼 바스락거린다. 이 나라가 낳은 화가, 뭉크의 ‘절규’도 안녕하다. 말풍선으로 ‘비싸서 돌아버리겠어’라고 써 놓고 싶긴 했지만.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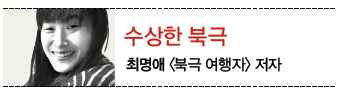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