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17 17:55
수정 : 2013.04.17 17:55
 |
|
방값 내기 힘든, 케를링가르피외틀 통나무집의 전경. 최명애 제공
|
[매거진 esc] 수상한 북극
요즘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들을 주유하고 있다. 그렇다, 내 팔자가 상팔자다. 사흘에 한번씩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나름대로 편리한 데가 있다. 특히 예약·결제가 편리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방이 있나 물어보고, 날짜만큼 계산해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돈부터 받는 데서는 밥도 안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이 선불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다. 돈을 못 내 집에 못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물론 그냥 튀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상황에선 사람이 그처럼 대범해지기가 쉽지 않다.
진짜로 돈을 못 내 쩔쩔맨 적이 있다. 아이슬란드를 남북으로 잇는 도로 키욀뤼르 루트에서다. 빙하와 화산을 옆구리에 끼고 달리는, 즉 아이슬란드의 여느 도로와 별다를 바 없는 이 도로에는 숙소가 딱 한 곳 있다. 비포장길로 10여㎞를 달리고, 개울도 두 개 넘으면 길 끝에 통나무집 예닐곱 동으로 구성된 숙소(마을)가 나온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전화를 하고, 또 하고, 또 한 끝에 간신히 나타난 주인은 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열쇠를 건넸다. “저 집 쓰고. 나는 바빠서 이만.” “저기, 지금 돈 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이만.”
아저씨는 좀 바빠 보이긴 했다. 사무실 지붕도 고치고, 나무다리도 고치고, 심지어 포클레인으로 길도 정비하고 있었다. 이 모든 작업을 아저씨와, 형광색 조끼를 입은 일꾼 한 명이 하는 것이었다. ‘저녁 바비큐 만들어 드려요’ ‘하이킹 정보는 스태프에게로!’라는 야심찬 안내판으로 보아, 식사도 제공하고 관광안내도 하겠다는 무리한 포부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너무 바빠, 사무실을 세 번을 오간 끝에야 간신히 라면 끓일 냄비를 빌릴 수 있었다. “돈도 지금 낼까요?” “아, 저는 직원이어서. 주인아저씨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뒷산 하이킹 코스는 사무실 문을 네 번쯤 두드린 뒤에야 간신히 파악할 수 있었다. 숫자 7이라고 적혀 있는 작대기를 따라서 한 바퀴 돌면 된단다. “참, 돈도 지금 낼까요?” “아,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우리 뒤를 따라온 독일 부부도 지갑을 꺼내다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이 외딴 마을은 주변 화산과 온천 관광의 거점이었다. 적어도 주인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강물이 있고, 열 받으면 폭발해 버리겠다고 쉭쉭거리는 화산이 있고, 몹시 못생긴 빙하가 있었다. 어떻게든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아저씨의 외로운 노력은 갸륵한 데가 있었다. 길도 없는데 여기저기 작대기 꽂아 하이킹 트레일을 만들었고, 급경사 내리막길엔 나무를 쌓아서 계단도 만들었다. 온천수 물길을 돌려 나름대로 노천온천도 만들었다. 내 평생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파란 비닐봉지를 바닥에 깐 ‘워터파크’는 처음 봤다. 돈은 다음날 아침에야 간신히 낼 수 있었다. “지금은 바쁘니까 좀 이따가.” “지금 간다고요 지금!”
발음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던 그 동네 이름을 찾으려케를링가르피외틀이다인터넷을 뒤졌더니 역시 이 아저씨, 실망시키지 않는다.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공사 중이시란다. 이 아저씨 손엔, 작업모를 쓰고 쉴새없이 일하는 레고 인형처럼 스패너가 달려 있나 보다.
최명애 <북극 여행자> 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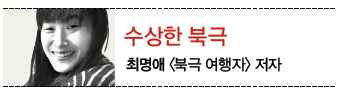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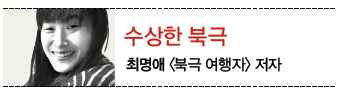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