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5.01 17:54
수정 : 2013.05.01 17:54
 |
|
‘영국 최북단’이라고 적혀 있는 더넷헤드.
|
[매거진 esc] 수상한 북극
지난해 겨울은 어쩌다 영국에서 나게 됐다. 새삼 깨달았는데, 영국은 엄청나게 추운 나라다. 기온이야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지만, 잔뜩 흐려서 그냥 온종일 으슬으슬 춥다. 방 안도 딱 우리나라 한겨울 베란다 수준이었다. 정말로 서양 사람들은 털이 많아서 추위를 덜 타는 건가. 어차피 종일 흐려 별 존재감이 없긴 했지만, 해도 너무 빨리 졌다. 심할 때는 오전 9시 넘어서 뜬 해가 오후 3시면 져버렸다. 그때 새삼 이 나라가 엄청 북쪽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런던의 위도가 북위 51도, 북부 스코틀랜드는 60도에 육박한다. 텔레비전 기상 캐스터도 매일 겁준다. “북극의 칼바람이 오늘도 정면으로 불어오네요. 쏘리!”
그렇지만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가 북극권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 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단 사람들이 뚱뚱하다. 유럽 전체에서 가장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영국이다. 이누이트들이 물범이나 고래의 지방층을 먹듯이, 영국 사람들도 지방을 많이 먹는다. 국가 대표 음식이 튀긴 생선과 감자튀김, 피시 앤 칩스 아닌가.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가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튀겨 먹는다. 마스바라고, 스니커즈 비슷하게 생긴 초코바가 있는데 그것도 튀겨 먹고, 심지어 버터도 튀겨 먹는단다. 도대체 튀긴 버터를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다.
물자가 부족했던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대구의 눈알까지 꼭꼭 씹어서 먹었다는데, 알뜰하기로는 영국 사람들도 뒤지지 않는다. 소의 콩팥으로 키드니 파이를 만들어 먹고, 해기스라고, 가축의 내장으로 순대 비슷한 것도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오크니 섬이나 셰틀랜드 제도 같은 영국 북부의 섬들은 북유럽 바이킹들이 유럽으로 진격하던 징검다리였다. 북극권에서 곧잘 보이는 퍼핀이란 새도 여기에 둥지를 틀고, 고래도 곧잘 나타난다. 봄에는 연어도 돌아오고, 겨울에는 오로라도 뜬다. 이쯤 되면 내가 드디어 쓸 거리가 떨어져 영국도 북극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님을, 믿어 주셔도 좋다.
영국의 최북단까지 가 본 적이 있다. 공식 영국 최북단은 더넷헤드다. 영국왕립조류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새 탐조대가 하나 있고, ‘여기가 영국 최북단 맞음’이라고 적힌 비석 하나가 달랑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처의 존오그로츠를 영국 최북단으로 ‘믿고’ 있다. 원래 존오그로츠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다시 해 보니 더넷헤드가 북위 58.67도로 0.03도 더 북쪽이었다는, 영국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쪼잔한 이야기가 있다. 어쨌든 꽤 높다. 북극곰이 어슬렁거리는 캐나다 처칠과 비슷한 위도다.
존오그로츠는 퇴락한 관광지처럼 보였다. 기념품을 파는 식당이 두 곳, 햄버거 파는 트럭 한 대가 전부다. 양심상 ‘최북단’이라고는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써서 관광객을 헷갈리게 하는 조잡한 티타월이며 머그컵이며 장식품 같은 것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남쪽 끝 콘월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1400㎞를 달려온 사람들은 ‘여기가 끝’ 표지판에서 사진을 찍고, 트럭에서 햄버거를 사 먹었다. 우리도 줄을 서서 피시 앤 칩스를 사서 먹었다. 영국 땅끝도 바람이 세다.
최명애 <북극 여행자> 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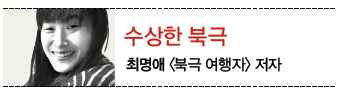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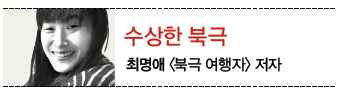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