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6.05 20:15
수정 : 2013.06.06 15:28
 |
|
로맨스소설들로 채워진 ‘놈 공항 문고’. 최명애 제공
|
[매거진 esc] 수상한 북극
내 짐가방은 ‘짐 찾는 곳’에 정말 짐짝처럼 던져져 있었다. 대부분 공항에는 짐 찾는 ‘컨베이어벨트’가 있다. 그러나 놈 공항에는 짐 찾는 ‘창구’가 있었다. 좋게 말해 창구지, 다 먹은 식판 갖다 놓는 배식구처럼 생긴 창구였다. 배식하는 아주머니는, 아니 짐 갖다 놓는 공항 직원은 셔터를 내리고 튀었다. 항의 따위는 받지 않겠다는 자세다. 역시 ‘놈’이다.
놈. 참으로 건방진 이름의 이 도시는 나름대로 알래스카 서북부의 항공 허브다. 앵커리지에서 출발한 큰 비행기들이 도착하고, 베링해 주변 원주민 마을들로 조그만 경비행기가 출발한다. 나는 아침 일찍 앵커리지를 출발해 놈을 거쳐 베링해의 외딴 에스키모 마을 시슈마레프로 가는 길이었다. 시슈마레프로 가는 비행기가 이틀, 사흘에 한번 있는 걸 고려하면 나쁜 스케줄은 아니었다. 5시간만 기다리면 됐다.
나름대로 항공 허브인 이 공항은 뭐랄까, 지방 소도시, 말하자면 경기도 가평쯤의 시외버스터미널 비슷해 보였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게 언제인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영구적으로 걸려 있고, 카운터의 직원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을 것 같은데 - 하루에 비행기 3대가 뜨고, 3대가 내린다 - 몹시 분주한 척하고 있었다. 약 5분간 면밀히 탐사해본 결과 이 공항엔 면세점도, 보안 검색도, 출입국 심사도 없었다. 대신 다른 공항에는 없는 게 있었다. 일단 공짜 커피다. 에스키모 아저씨들이 졸고 있는 옆으로 탁자가 있고, 탁자 위의 핫플레이트에서는 커피가…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스티로폼 컵에 따라서 가져가서 먹으면 된다. 쩨쩨하게 ‘양심껏 돈 내세요’ 하는 무인 카페가 아니다.
공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게 ‘공항 문고’도 있었다. 이 또한 여느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시설 아닌가. 베링해 부녀자조합에서 운영한다는 이 ‘문고’는 죄다 할리퀸 로맨스였다. ‘프랑스인의 사생아’ ‘계약 결혼 - 침실 전용 아내’ 이런 제목과 함께 괴로워하는 격정 남녀의 그림이 그려진 책들이었다. 에스키모 사회에서는 요즘 한창 로맨스소설이 조용히 유행하는가 보다. 음, 혹시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르니 로맨스소설 같은 걸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죽이라는 뜻일까? 공항 문고를 이용하시고 1달러씩 기부하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폭력으로 고통받는 지역사회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쓴단다. 불륜과 외도로 점철된 로맨스소설 대여 수익금으로 (아마도)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돕겠다는 이야기다. 나름대로 공정한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부조리한 이야기다.
“시슈마레프, 지금 타세요!” 비행기 탈 때 되면 알려줄 테니, 제발 저 구석에 좀 가만히 앉아 있으라던 직원은 나를 째려보며 ‘안내 방송’을 했다. 마이크도 필요 없는 조그만 공항. 짐을 이고 지고 끌고 탑승구로 달려갔다. 오늘의 승객은 나까지 3명. 기장은 아직 아니 오셨다. 뻘쭘하게 비행기 앞에 놓여 있는 내 짐가방에서 공항 코드가 찍힌 분홍색 태그가 달랑거렸다. ‘옴’(OME)에서 ‘쉿’(SHH)으로. 목적지가 쉿, ‘조용히’라니, 이런 북국의 시골 공항에서 떠나기에 제법 그럴싸한 장소가 아닌가.
최명애 <북극 여행자> 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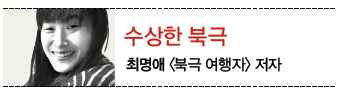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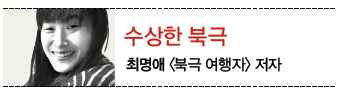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