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8.14 20:01
수정 : 2013.08.15 14:48
 |
|
오슬로 바이킹박물관. 바이킹의 배는 이물과 고물 끝이 둥글게 말려 있다. 최명애 제공
|
[매거진 esc] 수상한 북극
여기에 늘 에스키모가 어떻고 북극곰이 어떻고 써 대니 내가 에스키모로 태어나지 못해 한을 품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꿈의 지역은 북유럽이었다. 그러니 에스키모보다는 바이킹으로 태어나지 못해 한을 품었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이유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옛날부터 바이킹이 좋았다. 노르웨이 오슬로 어디엔가 있다는 바이킹의 배를 한번 보는 것이 내 오랜 로망이었다.
바이킹의 배가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정작 보러 가지는 않고 찔끔찔끔 바이킹에 대해 생각만 했다. 최후의 날엔 땅이 갈라지고 다리가 여섯 달린 말이 나온다는 북유럽 신화를 읽으면서 전율하고, <에다>나 <헤임스크링라> 같은 바이킹의 서사시도 구해서 읽었다. 바이킹이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룬문자도 보고 따라 그리고, 바이킹과 사촌지간이니까 하면서 켈트 음악도 찾아 들었다. 놀이공원에 갈 때면 열심히 바이킹도 탔다. 아, 이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정작 오슬로에는 가지 않았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다만 돈이 들 뿐이지.
나는, 조금은 무서웠던 것 같다. 정작 바이킹의 배를 보면 내가 키워온 북유럽 로망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그리고 그 자리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들까봐. 그러니 차라리 이루지 말고 그대로 꿈으로만 갖고 있을까도 싶었다. 코엘류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유리그릇 가게 아저씨가 그랬다.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그 꿈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 아저씨는 떠나기를 포기하고, 꿈을 찾아 떠나는 소년을 배웅했다. 직접 보면 그 크고 무섭고 대단해 보이던 바이킹의 배들도 그냥 조그만 조각배에 불과할지 모른다.
관광 시즌의 오슬로는 사람들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6월의 오후였다. 오슬로 바이킹박물관에 전시된 바이킹의 배는 낡은 목선 세 척이었다. 고물과 이물이 둥글게 말린, 내가 책 여백에 연필로 따라 그렸던 그 배다. 스페인에서 온 단체관광객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요란하게 배 주위를 에워쌌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운명> 교향곡도 울리지 않고, 눈앞이 슬로모션으로 느릿느릿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어쩐지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까지다. 그날 나는,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정면에서 쳐다봤다. 배에서 발견됐다는 의자 손잡이에 새겨진 인물상의 표정까지 보고 나니,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만큼 괴롭지는 않았다, 로망과 이별하는 것은.
코엘류의 그 말은 정말이었다. 꿈을 이루고 나면 새 꿈이 생긴다고. 로망이 새로운 로망을 낳고, 그 로망이 또다른 로망으로 이어져 우리의 여행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요즘 나의 로망은 잠시 동안 아이슬란드 거주민이 되어 고래가 찾아오는 바닷가에서 캐치볼을 하는 것이다. 이 로망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로망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 않듯 우리, 여행의 로망을 이루기를 두려워 말자.
최명애 <북극 여행자> 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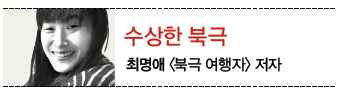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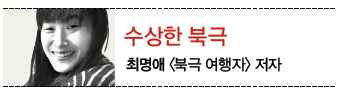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