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0.30 20:06
수정 : 2013.10.31 15:02
 |
|
최명애 제공
|
[esc] 수상한 북극 아이슬란드 동네 온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생각은 나라마다 다른 모양이다. 우리나라 시골 마을은 어디를 가도 마을회관이 있고, 영국 외딴 마을 어귀엔 어김없이 우체통과 빨간 공중전화가 있다. 아이슬란드의 사회기반시설은 아무래도 ‘주유소’와 ‘온천’인 것 같았다. 100여명 사는 조그만 동네쯤 되면 마을의 중심지는 어김없이 주유소였다. 주유소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달려 있고,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고, 운이 좋으면 피자도 구워 팔았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눈을 들어 쳐다보면 ‘온천’ 표시가 나왔다. 아무리 작은 산골 동네라도 어김없이 ‘이리로 가면 온천’ 표지판이 나오고, 표지판을 따라가면 구민체육시설처럼 생긴 온천이 나왔다. 온천 건물이 없으면 노천이라도 나왔다. 휴대폰도, 인터넷도 안 터져도 온천은 터진다. 일년 내내 춥거나, 추울 예정인 아이슬란드에서 온천은 사회 필수 기반시설인 모양이었다.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하루내 쌓인 피로를 푸는 곳. 외딴 시골 마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찾아간 레이캬비크의 라우가펠슬뢰이흐(Lagafellslaug) 온천도 그런 동네 온천이었다.
동네 온천은 뭐랄까, 구민회관 수영장 탈의실에 워터파크 야외 구간을 붙여 놓은 것처럼 생긴 곳이었다. 파도풀과 향기탕은 없지만 나름대로 어린이용 얕은 풀도 있고, 어른용 깊은 풀도 있었다. 뭘 구경하라고 지어 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관중들이 삥 둘러앉아 관람할 수 있는 계단식 스탠드도 있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온천 다이빙도 하나? 마침 근처 학교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나왔는지, 우당탕거리며 이 풀 저 풀로 뛰어다녔다. 유유히 체스를 두는 여학생들과, ‘깍두기’ 스타일로 머리를 깎은 아저씨들 사이로 조심조심 발을 집어넣었다. 아, 아이슬란드 온천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간다. 일본 온천을 생각하고 자연에 가까운 복장으로 들어갔다가는 시선을 한 몸에 모을 수 있다.
아주머니 서너 명이 조근조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이따금 소리를 내어 웃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다, 앞집 뒷집 옆집의 부부는 왜 자꾸 싸우나, 그런 이야기라도 하는 걸까. 온천욕을 끝내고 로비에 앉아 오렌지주스를 사 먹었다. 아까의 아주머니들이 옆구리에 가방을 끼고 머리를 털며 걸어 나갔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온천이 ‘마을회관’ 구실을 한다더니, 정말로 그런 모양이었다.
동네 온천이 아니어도 아이슬란드엔 온천이 많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블루라군’(사진).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아이슬란드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을 쓸어 모으며 외화벌이에 톡톡히 이바지하는 온천 되겠다. 입장료가 무려 35유로, 우리 돈으로 5만원 정도다. 동네 온천은 10분의 1 가격인 550 아이슬란드 크로나였다.
물론 우리가 동네 목욕탕도 가고 캐리비안베이도 가듯이, 블루라군은 블루라군대로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한없이 하늘색에 가까운 불투명한 물에서 수영하는 초현실적인 경험은 블루라군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거다. 그렇지만 온천을 끝낸 청소년들이 쫙 달라붙는 레깅스로 갈아입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립스틱을 바른 뒤 걸어 나가는 풍경은 블루라군에서는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다음번에 아이슬란드를 가면, 이번엔 다른 동네 온천을 가 봐야겠다.
최명애 <북극 여행자> 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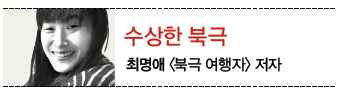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