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1.27 19:57
수정 : 2013.11.28 14:16
 |
|
랜즈엔드(Land’s End)
|
[매거진esc] 수상한 북극
랜즈엔드(Land’s End) - 땅의 끝. 영국 서남부에는 정말로 ‘땅끝’이라는 지명이 붙은 동네가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주소를 ‘땅끝’으로 넣으면 나온다. 아아, 땅끝.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아서왕이 용을 무찌르는 ‘4D 영화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년 여름까지 보수공사 중’이라는 안내판도 함께. 내가 백번 양보해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정도만 돼도 참아 주겠다. 그렇지만 아서왕과 용이라니. 아서왕은 용을 무찌른 적이 없다. 원탁의 기사와 함께 ‘위대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고 바빴다. 용을 무찌른 건 성 조지라는 전혀 다른 기사다.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따로 유명한 이야기를 묶어서 상품으로 만든 것이었다. 예전에 경주 어느 테마파크에서 ‘백제 계백장군과 신라 선덕여왕의 사랑 이야기’ 공연 하는 걸 본 적 있는데, 그런 이종교배가 다 국제 추세에 발맞춘 것이었구나.
‘용을 무찌르는 아서왕’은 거대한 ‘땅끝 테마파크’의 일부였다. 영국의 땅끝은, 출구 없는 젊은 영혼들이 찾아와 쓸쓸히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땅끝이 아니었다. 그냥,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땅끝 지역 자체가 원래부터 사유지였고, 모든 걸 ‘사유화’하던 대처 정부 시절 한 사업가가 사들여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땅끝 호텔, 땅끝 레스토랑, 땅끝 4D 영화관, 큰 기념품 가게와 작은 기념품 가게에, ‘땅끝 이정표’도 돈을 받았다. ‘여기가 땅끝’ 작대기 앞에는 ‘사진 찍고 싶으면 9.5파운드부터’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돈 안 낸 자는 이정표를 향해 다가갈 수 없도록 쇠사슬도 쳐놨다(사진). 정말 이자들이야말로 대동강 물을 팔아 장사를 하고도 남을 분들이시다. 숨 쉬는 것 빼고 다 돈 받는 유럽 저가항공은 역시 이런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
땅끝 인증샷 한 장 찍으려고 수백 킬로를 달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댔을까. 아니나 다를까 안내판에는 조그만 글씨로 ‘1957년부터 쭉 해 온 가업이니 너무 열받지 마시오’라고도 적혀 있었다. 쇠사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조그만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관광객들은 쇠사슬 앞에 잠시 멈추어 섰다, 어정쩡한 자세로 인증샷을 찍고는, 욕을 하며 총총 사라졌다. 잃을 것은 쇠사슬뿐. 세상의 관광객이여 단결하라.
말도 안 되게 비싼 땅끝 레스토랑에서, 너무 오래 달여 한약처럼 쓴 커피를 마시면서, 새삼 해남의 땅끝을 생각했다. 나는 오랫동안 해남의 배불뚝이 전망대가 땅끝의 전경과도 역사성과도 아무런 상관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관 주도형 전시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구시렁대 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이 점령한 영국 ‘땅끝’은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나을 게 없었다. 여기는 영국의 서남쪽 끝. 대각선으로 874㎞를 똑바로 달려가면 동북단 끝 ‘존오그로츠’다. 언제 내가 ‘영국의 쪼잔한 땅끝’이라고 이 칼럼에 쓰기도 했던 바로 거기다. 국토 종주의 출발점과 종점. 창밖으로 잔뜩 안장에 힘을 준, 먼 길 떠나는 오토바이들이 지나갔다.
사진 최명애 제공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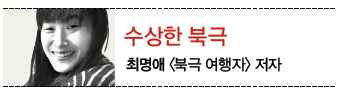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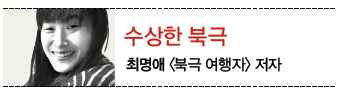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