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11 20:25
수정 : 2013.12.12 13:32
 |
|
사진 최명애 제공
|
[esc] 수상한 북극
북극권의 수상한 지역들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그다지 일신상의 위협이랄 걸 느낀 적은 별로 없다. 북극곰의 공격을 받은 적도 없고, 빙하 틈에 발이 빠진 적도 없다. 뜻한 바 아니게 지도 밖으로 마구 트레킹하다 털만 남은 새 사체와 곰 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친 적은 있지만 곰이 내 눈앞에서 포효한 것은 아니었으니 패스.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협은 엉뚱하게도 새다.
북극제비갈매기(사진)를 처음 본 것은 노르웨이 북쪽의 스발바르였다. 북극점에서 겨우 1300㎞ 떨어져 있는 이 섬의 여름은 제대로 백야였다. 오후 4시 정도의 질 듯 말 듯한 해가 밤새 그렇게 산꼭대기에 걸려 있었다. 긴긴 백야의 밤 동안 할 일도 없고,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항구로 산책을 나갔다. 갖다 버린 로프와 박스 사이로 발을 들이미는데, 갑자기 새 몇 마리가 미친 듯이 꽥꽥대는 것이다. 새들은 잽싸게 내 머리 위에 삼각편대로 포진하고 짖어댔다. 그 누가 새더러 노래한다 했나. 새들은 짖는다. 그것도 사납게. 내 정수리를 정조준하고 돌진하다 다시 후퇴하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기민하게 카메라 삼각대를 뽑아 휘둘렀다. 그러나 새들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돌진해 왔다. 한 걸음, 두 걸음 밀리다 결국 항구를 눈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퇴각했다. 내가 명색이 사람인데, 새가 무서워 후퇴를 하다니.
‘공격형 새’라고만 불렀던 그 새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이듬해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였다. 케이프타운의 기념품 가게에서 만델라의 사진엽서와 흉상들을 구경하다가 <우리 지역의 동식물>이란 책자를 뽑아 들었는데, 바로 거기 그 새가 있었다. 희고 검은 깃털, 날렵한 몸매와 뾰족한 부리, 무엇보다도 “사람의 머리 정도는 아랑곳 않고 쪼고도 남는다”는 무시무시한 설명이 바로 그 새였다. 영어로는 아틱 턴, 우리말로는 북극제비갈매기라고 부르는 이 새는 여름은 북극, 겨울은 남극에서 난다. 한해에 무려 7만㎞를 이동하는 강자다. 내가 공포에 떨었던 스발바르는 북극제비갈매기의 여름 산란지, 아프리카 최남단의 케이프타운은 중간 기착지였다. 산란기의 북극제비갈매기는 무척 사납기 때문에 숙련된 연구자도 헬멧을 쓰고, 머리 위로 작대기를 빙빙 휘두르며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그 새 산란지 한가운데를 겁도 없이 삼각대 하나 들고 걸어 들어갔으니. 그해 겨울 남극에 다녀온 동료가 정말 남극에도 그 새가 있더라고 알려줬다. 세종기지 연구원들은 그 새를 ‘남극’제비갈매기라고 부른단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이따금 북극제비갈매기가 생각날 때가 있었다. 북극에서 남극이라는 드넓은 ‘나와바리’와 자유가 부러워서만은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좀 부럽긴 하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 조그만 새가, 제 몸의 3분의 2를 태워가며 7만㎞를 날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어찌할 수 없이 감동적이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7배가 넘는 긴 거리를 온몸으로 밀고 날아가는 새들. 수상한 북극 마을의 여행이 내게 가르친 것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다. 고독을 견디며 묵묵히 살아가는 북극곰,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제 몸을 태워가며 날아가는 북극제비갈매기. 사람만큼이나, 자연은 경이롭다.
사진 최명애 제공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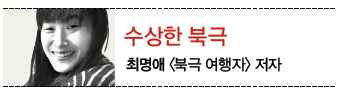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