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05 20:05
수정 : 2014.02.06 09:53
 |
|
노르웨이의 ‘국민 라면’인 미스터 리 라면. 최명애 제공
|
[매거진 esc] 수상한 북극
나는 왜 춥고 황량한 곳을 여행하는 걸까. 여러 가지 설득력 없는 이유들을 계속 대 왔으나, 아무래도 뭘 먹으러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여행 경비를 비행기표 사는 데 탕진했기 때문에 테이블보 깔린 식당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실 돈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극권의 많은 지역들은 식당이 해 떨어지면 잽싸게 문 닫거나, 아예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배 아프거나 서러울 일은 별로 없었다. 열흘짜리 알래스카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 보이는 식당마다 들어가 먹었으나 겨우 4끼를 채우고 남은 식비를 울며 반납한 슬픈 기억도 있다.
거기다 나는 ‘기회주의적 채식주의자’다. 안 보이게 갈아 주거나 바싹 구워 주면 먹지만, 원칙적으로 공식적으로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니 말코손바닥사슴 고기며, 순록 소시지며, 소송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먹을 수 있다는 북극곰 고기는 패스. 연어는 맛있지만 결혼식 뷔페에서 먹는 것과 차이가 없고, 단언컨대 알래스카 바닷가재는 질기기만 할 뿐 우리나라 대게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다 보니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면, 라면이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압도적인 빈도로 떠오른다. 종일 오락가락 비 맞으면서 떨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그렇게 생각날 수가 없다. 그때 라면만한 게 없다. 나만 그런 게 아니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도 한국 컵라면을 팔고, 알래스카 에스키모 마을에서도 한국 컵라면, 그것도 김치맛 라면을 판다. 에스키모들이 물범 사냥을 나갈 때 꼭 챙겨 간단다. 덜덜 떨다 라면 국물 한 모금이면 온몸이 후끈 달아오른단다.
일행 없이는 여행해도 라면 없는 여행은 상상할 수 없다. 상수도도 하수도도 없어 빗물을 받아 쓰는 마을에서는 봉지째로 라면을 부숴 ‘뽀글이’를 만들어 먹었다. 알래스카 외딴 마을에서는 거기까지 날아와 일하고 계시던 한국인 식당 아줌마가 라면 네 봉지를 내 배낭에 찔러 넣어 열렬한 동포애를 보여주시기도 했다. 언젠가는 숙소의 공동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갑자기 찾아온 강렬한 매운 냄새에 외국 애들이 갑자기 일제히 기침을 터뜨리는 당혹스러운 상황도 있었다. 재빨리 기침 대열에 합류하는 한편 저쪽에서 카레를 끓이고 있던 죄 없는 인도 애들을 노려봄으로써 상황을 모면했다.
노르웨이에는 그 유명한 ‘미스터 리’ 라면이 있다. 한국전쟁 고아에서 노르웨이 ‘라면왕’이 된 이철호씨가 만든 라면 브랜드다. 한때 내 꿈이 노르웨이 특파원이 되어 ‘미스터 리’ 라면 아저씨를 취재하는 것이었는데, 특파원은 못 되고 여행자가 되어 노르웨이 오슬로의 슈퍼마켓에서 ‘미스터 리’ 라면을 샀다. ‘베이컨 매운맛’ 킹사이즈. 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 미스터 리 라면은 별로 맵지 않다는데, 이건 진정 매운 버전이었다. 얼마나 매웠으면 봉지에 활활 타는 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뜨겁고 매운 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그래, 이 맛이야. 가슴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번져 가면서, 종일 꽁꽁 얼었던 몸도, 얼었다 녹았다 다시 얼었던 발가락도 풀리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한국에선 몸에 안 좋다고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왜 외국에서는 라면이 ‘약’이 되는지 모르겠다. 감기 기운이 돌 때도, 머리가 아플 때도 라면을 먹으면 괜찮아진다. 진정 미스터리다. <끝>
최명애 <북극 여행자>저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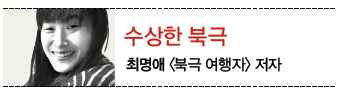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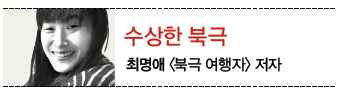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