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환으로 입원한 한 할머니가 9일 오후 노인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이곳에 들어온 노인들이 바깥에 나가 햇볕과 바람을 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
노인요양원 체험르포 (상) 존엄을 빼앗긴 황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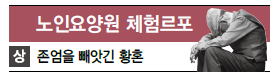 |
요양시설 세울 수 있어
4년새 1700→4326곳 ‘우후죽순’
아파트상가에 3곳 밀집도 환자 1인당 매달 150만~200만원
58명 요양시설 대표 월순익
어림잡아 3천만원 추정
‘황금알 낳는 거위’ 돼버려 ‘넓은 정원에서 한가롭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풍경을 감상하고 상냥한 직원들의 보호 속에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곳.’ 일반인들이 그리는 노인요양시설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일단 기자가 자원봉사를 한 요양원은 한적한 전원이 아닌 학원·식당·미용실·카페 등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 건물에 있다. 심지어 같은 상가 건물에 요양원 3곳이 운영중이다. 가까운 2개의 상가 건물에도 요양원이 1곳씩 있다. 아파트 단지 앞에만 대략 대여섯개의 요양원이 있는 셈이다. 말 그대로 우후죽순 난립한 모양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1700여개였던 노인요양시설이 2012년 4326개로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편안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책임져야 할 노인요양시설이 난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설립이 너무 쉽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만 맞추면 누구든지 시·군·구청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정 조건에 시설 면적 등 건축과 관련한 항목만 있을 뿐, 야외 녹지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햇볕과 바람을 쐴 야외 공간조차 없는 요양원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기자가 취재한 요양원이 자리한 시에만 90개의 시설이 운영중이다. 해당 시청 노인복지 담당자는 “좀더 멀리 가면 경치는 좋지만 이쪽이 수도권과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서 요양원들을 많이 세우는 것 같다. 지금 법으로는 주변 환경이 미흡하더라도 설립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를 봐도 2011년 서울에 443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지만, 경기도에는 3배 가까운 1174개가 문을 열고 있다. 인구가 아닌 땅값 등 입지적 고려가 작용한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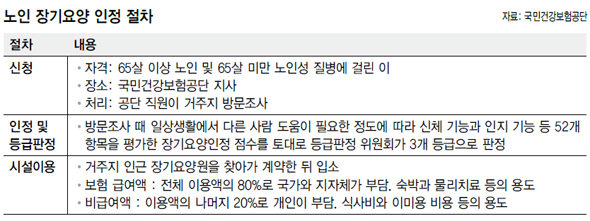 |
광고



기사공유하기